>1597039377> [ALL/일상/청춘/대립] 신세기 아야카미 - 47장 :: 1001
빗소리에 묻혀 ◆.N6I908VZQ
2024-03-07 23:17:27 - 2024-03-09 03:11:13
0 빗소리에 묻혀 ◆.N6I908VZQ (/zkZQN19gc)
2024-03-07 (거의 끝나감) 23:17:27
( situplay>1597033387>550 )
【 장마 (휴식시즌) 】 3月3日~3月8日
( situplay>1597039214>995 )
【 주요 공지 】
❗ 물건 빌리기 레이스 결과
situplay>1597039194>492
❗ 계주 결과
situplay>1597039214>987
❗ 불꽃놀이 아래에서 보자 2차 신청 ~3월 8일
situplay>1597039194>538
【 찾아가기 】
학생명부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7031088/recent
예비소집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7030184/recent
이전어장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7039348/recent
웹박수 https://forms.gle/sZk7EJV6cwiypC7Q6
위키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신세기%20아야카미
850 카가리주 (Ycuf3a5l5A)
2024-03-09 (파란날) 01:02:16
>>844 그치만 늘 프로페셔널한 유우키가 해결해주지 못해서 곤란한 상황이라니... 진짜 귀하고 귀엽단말이지😙😙
852 포피주 (TQ.ypNmMGI)
2024-03-09 (파란날) 01:03:47
855 사가라 테루 - 시라카와 유우키 (jrKrddC0Zo)
2024-03-09 (파란날) 01:05:48
"그렇구나."
애초에 그냥 한번 말해보기나 한 거라는 듯, 무감정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는 테루.
미련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실은 꽤나 슬펐다. 인간형 의태를 옷에 비유하자면, 본체는 알몸인 듯한 편안함이요, 인간형은 겉옷을 입은 듯한 느낌이었다.
즉, 정말로 편한 '휴식'은 본체로 누리고 싶다는 욕망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 말대로, 아야나라면 가능할지도."
아야나는 테루의 머릿속에선 이미 도라에몽이나 다름없었다. 아야나에몽, 공부를 못하겠어! 한 번 도움을 받았더니? 전교 1등. 아야나에몽, 밥을 줘! 말만 했더니 질 좋은 돌이 잔뜩. 아야나에몽, 현대 문화를 이해 못하겠어! 라고 하니 직접 알려주기까지.
이 문제도 말해본다면 아야나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테루로썬 그렇게 믿었다.
"아니야. 상담해줘서 고마웠어."
그 말을 마치곤,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856 유우키주 (TfxVCm7nUA)
2024-03-09 (파란날) 01:05:53
858 우라라주 (SBRvmQQGSk)
2024-03-09 (파란날) 01:07:44
우라라가 그냥 먼저 거기 지나가시는 분! 하면서 말 걸었다는 식으로 날조해서 그려오겠삼
860 우라라주 (SBRvmQQGSk)
2024-03-09 (파란날) 01:08:42
861 아야카미 ◆.N6I908VZQ (CDur8BBOCA)
2024-03-09 (파란날) 01:08:46
뒷마츠리 이벤트 - 밤 고정
이것 확실하게 하고 간다
진짜 간다아아아아ㅏ
863 유우키 - 테루 (TfxVCm7nUA)
2024-03-09 (파란날) 01:10:12
"아야나님은 카와자토 가의 자제니까요. 그리고 카와자토는 알아가는 재력가이자 유력가이기도 하고요."
그 어떤 것도 어지간하면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역시 여기서는 아야나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그는 판단했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지 자신이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테고. 우선 그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다. 너무 이쪽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자신이 모시는 이는 어디까지나 '카와자토'였다.
"후훗.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렇다면... 일단 저는 슬슬 좀 더 저택을 둘러보러 가볼게요. 그 이후에 같이 테루테루보즈 만들어봐요. 우리."
싱긋 웃어보이며 그는 슬슬 발걸음을 옮길 채비를 했다. 그녀가 붙잡지 않았다면 아마 안으로 천천히 들어섰을 것이고, 이후에 천을 수도 없이 가지고 와서 그녀에게 나눠주지 않았을까. 물론 붙잡는다고 한다면 좀 더 이야기할 의향은 충분히 있었다.
/슬슬 이벤트 기간도 되었고... 막레로 받아도 되고 조금 더 잇고 싶다면 이어도 괜찮아! 정말로 더 이어도 괜찮아! 다만 테루주도 이벤트 상황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쓴 거기도 하고!
864 아야나주 (KXok8ER9Ys)
2024-03-09 (파란날) 01:10:25
아 아무튼 그렇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66 우라라주 (SBRvmQQGSk)
2024-03-09 (파란날) 01:11:00
867 카가리주 (Ycuf3a5l5A)
2024-03-09 (파란날) 01:11:46
진짜 천사
너무 좋아
아야나 사랑해!!!!!!!!!!!(어휘력 상실)
>>859 오이맛 도라야키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ㅎ
>>861 오케이 오케이~ 캡틴 잘자~ 좋은 꿈 꿔~~😘
868 조몬 야요이 - 아이자와 히데미 (Yt.yoJrvb6)
2024-03-09 (파란날) 01:12:01
…긴가민가 했는데 정말로 아는 사이구나.
사장님이 저렇게 웃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옛날의 일이 그다지도 사랑스러울까.
이제는 없는 친구의 얼굴을 그 아들에서 찾을 정도로.
여름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이제 겨우 오후 여섯 시를 반정도 지난 시간이었지만, 세상에는 어둠이 내려 앉아있었다.
상관 없었다. 조금 처지는 날씨지만 이런 날씨가 더욱 어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지하 깊숙한 곳으로 숨어들면 바깥의 날씨 따위 아무런 상관이 없어진다. 제습기따위를 돌리는 소리는 조금 신경 쓰이지만.
“그건 내가 해야할 말인 것 같은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 말이야.”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 생각이었지만, 뭐 어때.
다들 저 정도는 하니까 괜찮겠지.
아이자와의 모습에는 변화가 있었다. 굳이 누군가가 짚어주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녀석이 들어오는 순간 느낄 수 있었다. 일전의 모습은 역시 취기가 올라 버려서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짓을 해버렸던 거겠지. 그때는 분명 건드리는 순간 형체를 잃고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달콤한 공포의 향기에 취해 있었는데.
오늘은 그 그림자가 아주 조금은 떨어져나간 느낌이었다. 보기에는, 더 나빠졌지만.
“…그야 어른이니까.”
확신은 없었기에 카운터 위를 침략해가는 꼬마 침략자의 이마를 가볍게 딱밤을 먹여주었다.
그날, 스튜디오에 있던 날. 딱히 특별한 날은 아니었다. 신곡의 마무리 작업만이 남아, 언제나 하던 것처럼 영감이 올 때까지 혼자 손이 찢어지도록 기타를 쳐대는. 그런 평범한 날이었다.
무엇이 계기가 되었던 것인지, 그저 아이를 스튜디오의 안으로 초대했고……… 그리고 강렬하게 명치를 두들겨오는 취기에 주인없이 방치 되어 있던 오래된 기타의 주인을 찾아주었다.
사장님에게 말을 했더니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는 듯이 아무 말 하지 않았더랬다.
그 날은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나를 이끄는 공포의 향에 취해 아이를 밀어 넣으려 들었고… 그리고 그것조차 하지 못해 결국 그냥 보냈다.
지금 당장 향하고 있는 곳의 위치조차도 모르는 채, 말로는 마음을 전하기 어려워 음악을 이용했다.
아이자와가 돌아간 이후에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기분이 나빴다.
변모해버린 ‘야요이’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나는 헛구역질을 했다.
내 안에 조금 남아있던 희망을 전부 토해버렸고, 고통과 절망으로 빈 곳을 다시 채웠다가.
그저,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고통과 절망마저 음악에 싣고 토해냈다.
그 아이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줄 건 없는데. 이거라도 마실래?”
적당한 잔에 콜라를 따라서 아이자와에게 건냈다.
기본적으로, DOG DAY에서는 소프트 드링크를 취급하지 않았지만 나름 칵테일종류는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서 그에 따라 기본적인 재료정도라면 있었다. 게다가, 아무리 그래도 그런 꼬마한테 술을 권할 수는 없잖아.
뭐 어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녀석이 잘못이지. 3천엔이나 하는 티켓 값도 받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으니까.
음료값정도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무아몽중으로 보고 있던데. 사장님이 연주하는 건 처음 봐?”
870 아야나주 (KXok8ER9Ys)
2024-03-09 (파란날) 01:13:51
쭈인님 설마 마츠리때 오이맛 도라야키 먹일 생각 아니지?????
아무리 쭈인님을 사랑한다 해도 오이맛 도라야키는 좀 ㅋㅋ;;
>>866 진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너 진짜 개구리같다" 임
874 카가리주 (Ycuf3a5l5A)
2024-03-09 (파란날) 01:19:20
>>872 헐
1톤 넘는 테루 펀치랑 물의 힘으로 하이드로펌프 쏘는 아야나랑 맞짱 뜨는 거 상상하니까 가슴이 웅장해짐;;; 이거 완전 가슴이 웅장해지는 나루토 주먹질 짤 아니냐???
876 유우키주 (TfxVCm7nUA)
2024-03-09 (파란날) 01:20:10
다음에 유우키가 정체를 알게 되면 맛있는 돌을 많이 선물할게!
아마 유우키는 진짜로 테루 옆에서 테루테루보즈를 만들어서 창문에 막 걸어뒀을거야!
883 우라라주 (SBRvmQQGSk)
2024-03-09 (파란날) 01:37:34
첩첩
이거 맛있따 첩첩
갠적으로 난 gl쪽 좋아해서
이 커플 항상 맛있게 먹는단 말이지
자주 주세여
888 카가리주 (Ycuf3a5l5A)
2024-03-09 (파란날) 01:44: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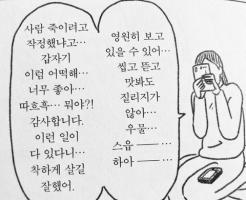
아야나 사랑한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 아직은 일상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히 몰라서 못하고 있는데??? 일상 돌리기만 해봐 현금술 갈기겠다👊🏻👊🏻👊🏻👊🏻💥💥💥
895 카가리주 (Ycuf3a5l5A)
2024-03-09 (파란날) 01:54:17
나는 커미션도 원기옥 갈기는 타입이라서 일상의 조명온도습도분위기 다 알아야 하겠으니까 쫌만 참아주세요😘
>>893-89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897 야요이주 (Yt.yoJrvb6)
2024-03-09 (파란날) 01:56:03
나구나 왜 날 말리지 않았느냐 나 이놈아...
899 아야나주 (KXok8ER9Ys)
2024-03-09 (파란날) 01:58:20

나 벌써부터 이미 일상 시뮬레이션 돌아가고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