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7027135> [초능력] 초능력 특목고 모카고 R2 87.여름하면 떠오르는 것은? :: 1001
◆TMmm6tsoPA
2023-12-06 18:22:56 - 2023-12-07 20:13:23
0 ◆TMmm6tsoPA (UAiMOE7qps)
2023-12-06 (水) 18:22:56
※상황극판의 기본 규칙과 매너를 따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먼저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집시다. 모니터 너머의 이용자도 당신처럼 '즐겁고 싶기에' 상황극판을 찾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오고 가는 이에게 인사를 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상대를 지적할때에는 너무 날카롭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15세 이용가이며 그 이상의 높은 수위나 드립은 일체 금지합니다.
※특별한 공지가 없다면 스토리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7시 30분~8시쯤부터 진행합니다. 이벤트나 스토리가 없거나 미뤄지는 경우는 그 전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도중 반응레스가 필요한 경우 >>0 을 달고 레스를 달아주세요.
※계수를 깎을 수 있는 훈련레스는 1일 1회로, 개인이 정산해서 뱅크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훈련레스는 >>0을 달고 적어주세요! 소수점은 버립니다.
※7일 연속으로 갱신이 없을 경우 동결, 14일 연속으로 갱신이 없을경우 해당시트 하차됩니다. 설사 연플이나 우플 등이 있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존 모카고 시리즈와는 다른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기존 시리즈에서 이런 설정이 있고 이런 학교가 있었다고 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 설정이 적용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R1과도 다른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개인 이벤트는 일상 5회를 했다는 가정하에 챕터2부터 개방됩니다. 개인 이벤트를 열고자 하는 이는 사전에 웹박수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는 계수 10%, 참여하는 이에겐 5%를 제공합니다.
부원 명부: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965135
설정: https://url.kr/n8byhr
뱅크: https://url.kr/7a3qwf
웹박수: https://url.kr/unjery
위키: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EC%B4%88%EB%8A%A5%EB%A0%A5%20%ED%8A%B9%EB%AA%A9%EA%B3%A0%20%EB%AA%A8%EC%B9%B4%EA%B3%A0%20R2
저지먼트 게시판:https://url.kr/5wubjg
임시 스레: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44057
에피소드 다이제스트: https://url.kr/tx61ls
전판 주소: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7027112
바다 이벤트:situplay>1597026085>541
665 혜우주 (peL6I3ncTw)
2023-12-07 (거의 끝나감) 02:09:54
으앙앙ㅇ아아앙아아 반죽된다 (쫀득해짐)
667 혜우주 (peL6I3ncTw)
2023-12-07 (거의 끝나감) 02:11:09
그치만 혜우우가 밥 제대로 안 먹어서 어쩔 수 없었대
매끼니마다 다 먹을때까지 압수당함
668 성운주 (1obPDCepFw)
2023-12-07 (거의 끝나감) 02:12:54

>>663 일단 성운이한테 한번 물어보구요... 왠지 요번일상 혜우한테 성운주의 자세와 성운이의 자세가 달라요 👀
>>666 아지주도요...? (이사람 졸림)
670 혜우주 (peL6I3ncTw)
2023-12-07 (거의 끝나감) 02:19:08
둘이 잘 절충해줘 응
혜우는 둘째치고 나는 몹시 즐거우니까
그리고 졸리면 일단 자라 (복복복복)
672 혜우주 (peL6I3ncTw)
2023-12-07 (거의 끝나감) 02:28:11
어제 고생 많았어 성운주
오늘밤 잘 자고 좋은 하루 보내자
674 애린주 (L6CSIdPnbc)
2023-12-07 (거의 끝나감) 02:34:28

>>665 오, 안그래도 조만간 만두 빚어야 할거 같은데 좋은 반죽이군. (?)
(조물조물 심해액체냥이)
개빡친 토끼 귀여워~~~ 사실 짤의 이 모습이 진짜 개빡친 토끼라곤 하지만~
>>668 음, 역시 앙고라토끼야. 빗질하는 맛이 있지. (??)
(복복복복복복복복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박)
675 애린주 (L6CSIdPnbc)
2023-12-07 (거의 끝나감) 02:36:02
이지주도 자고 혜우주도 자자~~~ (뽀요뽀요뽀요뽀요뽀요뽀요뽀요뽀요)
676 혜우주 (peL6I3ncTw)
2023-12-07 (거의 끝나감) 02:41:30
>>674 (흐물흐물)(만두 소리에 빠져나감)
그럼 저건 덜 빡친 토끼로 하자
와 근데 귀가 저렇게 벌어져야 진심빡침이구나
진짜 하찮아서 귀여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77 애린주 (L6CSIdPnbc)
2023-12-07 (거의 끝나감) 03:17:24
그렇다고 하네~~~ 그럼 바니걸 바니보이는 다들 빡친 걸까... 🤔🤔🤔🤔🤔
저 앙다문 진지한 주댕이도 오히려 귀여움...
토깽이 특유의 코입이 이어진 선이 넘나 귀엽거덩...
682 천 혜우 - 훈련 (peL6I3ncTw)
2023-12-07 (거의 끝나감) 06:43:47
>>0
>>444
작은 연주회는 휴가 중 매일 저녁마다 열렸다.
기본적으로는 클래식 음악을 연주했지만
잘 알려진 가요를 즉석에서 커버하기도 하는 둥
그리 지루하지만은 않은 자리였다.
연주자가 아닌 청자로 인해 흐름이 끊길 줄은 몰랐지만.
끼긱!
딱 하나의 잡음이 순조롭게 이어지던 연주를 끊었다.
어긋난 활을 들고 천천히 소리의 근원을 바라보았다.
작게 숨 들이쉬는 그 소리가 이걸 위해서였다니.
거기다 뻔뻔하게 앙코르를 읊는 낯짝을 보고 쯧, 혀를 찼다.
분명 수영장에서 떠민 복수겠지만
그렇다고 연주를 망쳐?
내 생각이 적반하장이라 해도 상관없었다.
스읍, 호흡을 고르고 다시 활을 들었다.
연주하던 곡을 이어가지 않고 새 곡을 시작했다.
선곡은, 그래, 어디 또 한 번 방해할 테면 해봐라 라는 마인드로 고른 곡이었다.
강렬한 곡의 연주를 끝으로 오늘의 연주회가 끝났다.
나는 첼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남들에 비하면 조금 늦게 자리를 벗어났다.
오늘은 일부러 더 느릿하게 정리해서 누가 어디로 가는지 뒷모습을 봐두었다.
묵직한 첼로 케이스를 챙겨든 후에 천천히 타겟의 뒤를 쫓았다.
어차피 펜션으로 가는 길과 겹치니 따라간다는 오해는 생기지 않을 터였다.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저 앞에서 흔들거리는 분홍 뒷통수를 따라가서
손을 뻗으면 닿겠다 싶을 쯤-
짜악!
찰진 소리가 나게 그 등을 후려쳤다.
그리고 재빨리 그의 앞으로 나서며 메롱, 하고 혀를 내밀었다.
내가 먼저 밀었거나 말거나 연주를 방해한 대사는 치러야 마땅했다.
그런 다음 딱히 뛰지도 않고 몇 걸음 앞서서 걸어갔다.
음, 이대로 첼로 케이스를 두고서 다시 나와 산책이나 해야겠다.
>>359
그리하여 펜션에 들러 첼로 케이스를 놓고, 잠시 뒹굴거렸다.
막상 들어오니 다시 나가기 귀찮아져서 그런 것도 있었다.
거실 소파에 누워 머리를 올려 묶을까 양갈래로 땋을까 따위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엌 쪽에서 라면을 해먹느니 뭐니 한다며 와글와글 해졌다.
듣자하니 해물 라면이라는데, 딱히 입맛이 당기진 않는 메뉴였다.
가만히 있고 싶었지만 눈에 띄면 혹시나 휘말릴까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해도 졌으니 맨발로 해변의 모래나 좀 밟아볼까 싶었다.
그래서 나올 때 작은 에코백에 생수 한 통과 손수건 따위를 챙겼다.
신발도 일부러 가벼운 슬리퍼를 신고서 해변으로 향했다.
낮은 파도가 검게 일렁이는 해변은
딱히 조명이 없어도 반짝반짝 아름다웠다.
낮의 바다도 아름답지만 개인적으로 밤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다.
분명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지.
아무도 없어보이는 해변을 맨발로 딛자
낮의 온기가 남은 모래가 부드럽게 발에 밟혔다.
간지러웠지만 사그락 밟히는 느낌이 꽤나 중독적이었다.
벗은 슬리퍼를 한 손에 들고, 모래가 반짝이는 것을 보면서 걸었다.
지나온 길에 아담한 발자국이 생기는 것을
간간히 돌아보며 걷다 보니 제법 멀리까지 오게 되었다.
어디쯤 왔을까 하며 고개를 들어 주변을 돌아보던 그 순간,
그의 당황스러운 목소리 만큼이나 황당하다는 눈빛을 숨길 수 없었다.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요. 여기서 뭐해요?"
뭐하냐고 묻긴 했지만 그 대답을 들을 것도 없이 그가 뭘 하고 있었는지 파악했다.
바다의 짠내와는 전혀 다른 비릿한 철내음이 밤공기를 타고 흘러왔다.
여기에도 있었던 것일 테지.
그 괴이인가 뭔가 하는게.
미간을 팍 찡그리며 그를 흘겨보았다.
"얌전히 숙소에 박혀서 해물 라면인지 뭔지나 먹고 있을 것이지."
어쩐지 안 보인다 싶더라니.
나는 그가 또 무슨 핑계나 변명을 하며 도망가기 전에 잡아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그 팔부터 붙잡으려 했다.
아파하던가 말던가, 제법 강하게 팔을 쥐려 하며 말했다.
"저 안에서 다 먹고 자고 하는데 잘도 안 들켰겠어요. 어? 폰은 장식이야? 다쳤으면 부르라고. 또 침 바르면 낫느니 어쩌니 하면 상처에 손가락 찔러버려, 진짜."
그런 살벌한 말들을 하면서도 내 능력을 사용해 그의 몸에 있을 부상들을 회복시켰다.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살피고 하는게 좋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니 전신을 순환하듯 회복시키는게 최선이었다.
부상이 다 낫고 고통도 사그라들 때 쯤 능력을 멈추었다.
그리고 메고 있던 에코백에서 손수건과 생수를 꺼내, 적신 손수건을 만들어 그에게 주었다.
줬다기보단 얼굴에 찰싹 붙여줬다는게 맞겠지만.
"이걸로 얼굴이나 깨끗이 닦아요. 그 꼴로 들어갔다가 시끄럽게 만들 일 있나."
거기까지 해준 다음에, 잠시 동안 그를 빤히 응시했다.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입술을 달싹이기도 하면서.
하지만 곧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렸다.
"됐다. 내 일인데 뭐."
그런 다음 그에게 손수건 다 썼으면 달라는 손짓을 했다.
손수건을 돌려받고나서, 혹은 주지 않았더라도, 작은 한숨을 내쉬곤 다시 밤의 해변을 걷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듣기 좋던 밤바다의 파도 소리가
어쩐지 처량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683 동월주 (QaLipcYZ7g)
2023-12-07 (거의 끝나감) 09:25:17
>>68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혜우우 반존대 뭐야 설렌다 (?)
손수걱 찰싹이라니 그래도 치료해줘서 고마워요 ^-^ 마지막엔 무슨말 하려했을까 궁금한데🤔🤔
좋 은 아 침!!!!!!!!!!!!!!!!!!!!!!!!!!!!!!!!!!
685 ◆TMmm6tsoPA (/LquHBcwYM)
2023-12-07 (거의 끝나감) 10:42:21
그러니까 하려던 말을 해도 괜찮아요.(소근소근)(사르륵)
686 동월주 (WzRKIK4HAU)
2023-12-07 (거의 끝나감) 10:48:01
아지주 캡틴 안녕하세요!!!!!!!!!!!!!!!!!!!!
687 아지주 (1S/HeyG36.)
2023-12-07 (거의 끝나감) 10:49:01
그럼 나 사실 (기차지나가는 소리)(코끼리가 코로 물뿜는 소리)(하마가 하품하는 소리)(돌고래 웃음소리)
690 동월주 (QaLipcYZ7g)
2023-12-07 (거의 끝나감) 10:59:39
>>688 괜찮아!!!!!!!!!!!! 아지주도 앚이주도 모두 아지주이자 앚이주.... 어? (혼란)
691 여로주:3 (mdUeBcpk/c)
2023-12-07 (거의 끝나감) 11:03:22
692 아지주 (371swoT5Yw)
2023-12-07 (거의 끝나감) 11:08:03
여로 바다 즐기자!
>>690 헷갈려!!!!!
693 동월주 (QaLipcYZ7g)
2023-12-07 (거의 끝나감) 11:12:16
>>692 그런게 또 아지주와 앚이주의 매력... (끄덕)
695 동월주 (WzRKIK4HAU)
2023-12-07 (거의 끝나감) 11:34:26
다들 점심 먹자 점심!!!!!!!!!!!!!!!!
698 애린주 (L6CSIdPnbc)
2023-12-07 (거의 끝나감) 11:53:14
아닌가? 좀 무거울지도...? (아무튼 화남)(말랑말랑말랑말랑)
>>696 또잉또잉 끼여어어어엉!!!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박)
시외버스 출퇴근 대다내~~~
700 동월주 (WzRKIK4HAU)
2023-12-07 (거의 끝나감) 11:5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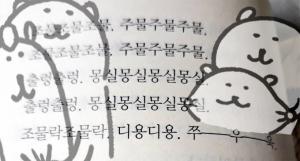
>>698 핫하하 무겁지 않더라도 애린주의 뽀요뽀요는 날 짓누르지!!!!!!!! (말랑말랑탱글탱글) (맞주물주물) (짤)
701 애린주 (L6CSIdPnbc)
2023-12-07 (거의 끝나감) 12:31:02
>>700 으어어으아에... (극락의 경락마사지 당함)(주금)(범인은 동원참치주)
702 여로주:3 (vJblfnyp2M)
2023-12-07 (거의 끝나감) 12:46:05
시켜먹는 건 무리였구.. 삼각김밥이랑 컵라면 먹었다!!!
703 청윤주 (VR.uO4V4z6)
2023-12-07 (거의 끝나감) 12:57:01
704 동월주 (WzRKIK4HAU)
2023-12-07 (거의 끝나감) 12:59:03
>>702 내가 동원참치가 아니에요!!!!!!!!! DX
쪼오금 부실하지만 잘해따~~~!!!!!!!!!!
706 애린주 (L6CSIdPnbc)
2023-12-07 (거의 끝나감) 13:09:39
>>703 청윤주 아뇽~~ 닭육수 라면이라! 은근 맛있지!! >:3
>>704 앗... 아아... 안돼! 더이상 월월이가 아니게 되어버려...!! (오열)
707 동월주 (QaLipcYZ7g)
2023-12-07 (거의 끝나감) 13:25:14
흑흑 일하기 싫다.... 일상이던 훈련이던 독백이던 일단 손을 좀 움직여봐야겠어... (밍기적)
712 동월주 (QaLipcYZ7g)
2023-12-07 (거의 끝나감) 14:21:37
수강이는.... 14일 이상의 갱신 없음으로 그만.... (옆눈)
715 아지주 (T7NEo8ttoQ)
2023-12-07 (거의 끝나감) 14:31:46
다시 돌아와!!!!!!(비명!)
>>713 우리 소중한 자이로드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