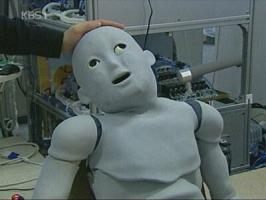>1596297086> [ALL/양과늑대/플러팅] "Bite" - Twenty_Five :: 1001
어머어머 볼에 뽀뽀한데요!! ◆Sba8ZADKyM
2021-09-04 23:48:03 - 2021-09-08 18:25:03
0 어머어머 볼에 뽀뽀한데요!! ◆Sba8ZADKyM (58t8QeZa1c)
2021-09-04 (파란날) 23:48:03
현존하는 양과 늑대는 평화롭게 풀이나 고기나 뜯고 있겠죠.
그래서 당신은 뜯는 쪽입니까, 뜯기는 쪽입니까?
하하. 뭐건 악취미네요.
선을 넘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부디, 맛있게 드세요.
※플러팅은 자유입니다.
※'수위'는 반드시 반드시 지켜주세요.
※캐조종, 완결형 금지입니다. 민감한 부분은 꼭 먼저 상대방에게 묻고 서술합시다.
※캡틴이 항상 관찰하겠지만, 혹시나 지나친 부분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웹박수로 찔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트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91097
선관/임시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84096
익명단톡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91098
웹박수 https://forms.gle/svRecK4gfgxLECrq8
이벤트용 웹박수 https://forms.gle/6Q7TyppVp8YgDDiP7
위키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Bite
현재 🏖️바다로 갑시다! 이벤트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9/12)
3 하늘주 (MNHdQbZfV6)
2021-09-05 (내일 월요일) 02:07:39
6 하늘주 (MNHdQbZfV6)
2021-09-05 (내일 월요일) 02:15:35
물론 농담이야. 아무튼 난 자러 갈래. 자고 일어나면 재밌는 일이 있으려나 후후.
내일 일상 마무리짓고 일반 바다 새 일상 구해도 돌릴 수 있는 이는 없겠지? 느긋하게 팝콘이나 튀겨야겠네.
암튼 잘 자라. 바이바이.
13 새슬주 (lEXrqm8pjo)
2021-09-05 (내일 월요일) 02:22:52
15 슬혜주 (heBC3SpGJU)
2021-09-05 (내일 월요일) 02:29:19

하늘주 잘자는 거시야!!!!!! 푸우우우우욱 잠들어라!!!!!!!!!!
16 새슬주 (lEXrqm8pjo)
2021-09-05 (내일 월요일) 02:32:54
>>15 아니 이런 짤까지... 있다고 >:0....?
고영짤의 한계 어디까지인가
17 문하주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2:34:02
풀악셀이 있고 적정속도가 있습니다 어느쪽?
18 연호주 (m.es43TS6Q)
2021-09-05 (내일 월요일) 02:39:55
답레를..... 쓰기는 썼는데......... 어쩐지 올리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무한점)
20 문하주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2:44:16
그 느낌 나도 알지... 그러나 올리지 않으면 다음 답레는 돌아오지 않아.. (?)
>>19 네..............(무한점)..........
21 새슬주 (lEXrqm8pjo)
2021-09-05 (내일 월요일) 02:49:08
>>20 (이마팍팍)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미 유새슬 목줄 놓친 지 오래입니다. 아 거 좋을대로 해 주십시오...(말라죽음)
22 [이벤트] 문 하 - 유새슬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2:54:18
문하가 원하지 않았고 새슬이 의도하지도 않았겠지만, 함께 춤을 추면서 문하는 새슬의 손을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지 . 붙들어늘어지고 싶지는 않았다. 그저, 정확히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잡아주는 것. 그 정도 거리를 두면, 같은 박자로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디에 닿게 되더라도, 누군가의 옆에─ 다른 누구도 아닌 새슬의 옆에 있을 수 있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문하는 생각하며, 자신의 품에 얼굴을 파묻는 새슬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안아 주었다.
어쩌면, 어딘가에서 느껴본 꽤 익숙한 질감일지도 모르겠다. 그 손목도, 러닝셔츠 바람의 품도.
"괜찮아."
문하는 조용히 대답했다.
"길 잃고 헤매는 건 나도 자주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헤매는 거라면 내가 누구보다도 잘할 거야. 새슬이 문하와 함께 헤매어주었듯이, 문하 역시도 새슬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
"너를 속박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너와 함께 가고 싶어."
"내가 돌아갈 곳이 너였으면 하고, 네가 돌아오는 곳이 나였으면 해."
"낙원으로 향하게 될지 지옥으로 향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와 함께 갈 수만 있다면 다른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24 [이벤트] 화연호 - 금아랑 (m.es43TS6Q)
2021-09-05 (내일 월요일) 03:00:36
짧게 대답했다. 잠시 무표정한 얼굴로 무언가를 생각했던것 같지만, 이내 원래대로 돌아와 다시 웃었다.
Un italiano?
라는 물음에 그는 뭐라 대답하지 못하고 어깨를 으쓱였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깨를 으쓱인 행동을 해석해보자면 '난 이탈리아인이 아닌걸' 이라는 뜻일테다. 이탈리아어는 고사하고 외국어 자체에 약하니, 어쩔 수 없는 반응이었다. 애초에 지금 아랑이 한 말이 이탈리아어라는걸 알고는 있을까?
" 그런것 같아. "
그는 단정지을 수 없었다. 사람의 심정이란 읽어내기 힘든 것이다. 신체능력이 그의 재능이고, 그가 바보같은 사람인 이상 아랑의 감정을 읽어내는 재주는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 무지를 싫어하지 않았다.
아랑이 이렇게 애교있는 웃음을 짓고 있다지만,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대답하면서도 마주 웃지는 않았다. 방금 전의 차분함과는 대비되는 웃음을 봐서일까,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아랑의 외국어에(연호는 어느 나라 말인지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잠시 고장난 표정을 지었지만, 어차피 알아듣지 못할거 신경쓰지 말자고 생각하며 훌훌 털어버렸다. 뜻은 직접 물어보면 되는거라지만, 어쩐지 그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지.
" 넌 어떤 느낌이든 좋아. "
다시 한국어로 말해주었지만, 이게 방금 그 뜻인가? 잘은 모르겠어도 문장의 길이가 달랐으니, 연호는 둘이 다를것이라 막연하게 생각했다.
아랑이 어째서 평소와는 다르게 차분한지 궁금했지만 구태여 묻지는 않기로 했다. 세상엔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는 법이다. 연호에게도 그런게... 있었나? 아마 그에게는 물어본다면 대답해줄 것이다. 숨기는것에는 서투른 그였으니까.
그러고보면 슬슬 포크댄스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잡고있지 않은 손도 아랑에게로 내밀었다. 포크댄스는 양손을 잡고 추는 동작이 많더라고. 나지막히 덧붙였다.
" 난 숨기는걸 잘 못해. 왠지 알아? "
춤을 추는동안 너무 조용하다면 그 춤은 재미없는 춤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어색한 춤이 될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그는 입을 열었다. 다만 그 주제가,
" 옛날에 내 친구중에, 숨기기만 하다가 곪아서 터진 친구가 있었거든. "
적당한 주제인지는,
"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특히 너라면. "
모르는 일이다.
왜일까? 그는 본인도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슬쩍 기울였다.
물론 숨기기만 한다고 무조건 곪아서 터지는건 아니었다. 연호도 그것을 알고있을테다. 잘만 숨긴다면 조금 곪기는 해도 터지지는 않을수도 있다. 그럼에도 저렇게 말한건,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는걸 에둘러서 표현한걸까.
"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
그는 드디어 춤을 시작하려는 것 처럼, 한 걸음 아랑에게로 다가갔다. 발걸음에 리듬감이 담겨있을수도 있다.
" 선택은 너의 몫이야. "
선택에 옳고 그름은 없다. 결과만이 있을 뿐이다.
28 연호주 (m.es43TS6Q)
2021-09-05 (내일 월요일) 03:07:16
>>26 귀한..... 가요....? (머엉)
>>27 맞워요 다들 귀여움!!! (쓰담담다담)
29 새슬주 (lEXrqm8pjo)
2021-09-05 (내일 월요일) 03:12:36
>>23 어떻게 해야 풀악셀을 밟지 않을지...................고민하고 있습니다.........
30 슬혜주 (heBC3SpGJU)
2021-09-05 (내일 월요일) 03:15:25

심야에 기습으로 올리는 단명헤어 양아치...
해변가 에디션이다아...
31 연호주 (m.es43TS6Q)
2021-09-05 (내일 월요일) 03:18:32

>>29 몬가.... 비설을 풀거싶기는 한데 빨리 풀어버리면 할게 없으니.... 속도조절을 하고있습니다..... (무한점)
32 슬혜주 (heBC3SpGJU)
2021-09-05 (내일 월요일) 03:20:55
비설 풀기엔... 아직 여름밖에 안된 거시야~~~~~~~!!!!!!
그래도 간간히 나오는거 열심히 먹겠슴다 선생님들. (존버중)
33 문하주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3:22:02
>>30 슬혜를 고양이라고 했었나, 정말 잘 빗댔다고 생각해. 새침하고 종잡을 수 없으면서도 이따금 살가운 모습이라고 해야 하나?
34 연호주 (m.es43TS6Q)
2021-09-05 (내일 월요일) 03:28:10
35 슬혜주 (heBC3SpGJU)
2021-09-05 (내일 월요일) 03:28:57
>>33 그리고 자주 고장나지! >:3
게다가 고양이는 자기가 아픈걸 티를 잘 안내기도 하구 의외로 외로움을 잘 탄다고 하지!
못되어먹은 부분마저 고앵이스러운 거시야...
36 슬혜주 (heBC3SpGJU)
2021-09-05 (내일 월요일) 03:33:31
(생각해보니 그렇기도 하다.)
벌써 여름에 25스레... 그래도 이번에 바뀌면서 계절 간극은 더 길어진거 같긴 하지만 생각해보니 빠르구먼,
그러니 어서 서사도 쌓고 러브라인도 쌓으라구!!!!!!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고양이의 여유인 것입니다 휴먼,
이제 친구 100명 사귀기 도전이다~~~~~!!!!!
37 연호주 (m.es43TS6Q)
2021-09-05 (내일 월요일) 03:35:55
어.... 러브라인이요? 얘가요? (연호 봄)(안봄)
._.)
_.)
.)
)
(사라짐)
38 [이벤트] 유새슬 - 문하 (lEXrqm8pjo)
2021-09-05 (내일 월요일) 03:48:38
이상하지, 생각해 보면 그리 오래 본 얼굴도 아니었는데. 곁에 있으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었다. 잡아 이끄는 손도, 이따금씩 품이나 어깨를 조용히 내어주는 것도, 내뱉는 말도.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는 것.
몰아쳐 오는 소년이라는 이름의 파도와, 욕심이 저도 모르는 제 안을 야금거리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었다. 묶고 묶이는 것은 무섭다. 사랑이나 호감이라는 이름 하에 무언가에 속박당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주춤거리며 뒷걸음을 쳤었는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서 있는 곳은 다시금 소년의 품 속이다. 이상했다. 모르는 사이에 말뚝에 매여 버렸나? 자고 있는 사이에 잡혀 버렸나? 아니다. 목, 발목, 손목. 더듬어 확인해 보아도 손에 걸리는 끈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 매여있는 것 같음에도 매여있지 않은 것. 원래라면 일어야 할 혐오나 불쾌감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 보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은 여전했다. 그러나, 글쎄. 거칠게 묶였다기보다는 소중하게 감싸안아진 것 같은 그 감각이ㅡ
너를 속박하고 싶지 않아.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은 채, 잠잠히 이야기를 듣던 새슬이 두 팔을 뻗어 문하의 목덜미를 감았다. 그리곤 천천히 당겨서, 이마를 툭. 눈을 감은 채로 잠시 그렇게 있었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속삭임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있잖아,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치만. 작게 숨을 삼킨다.
“네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색이 아닐까.”
붙어 있던 이마가 떨어졌다. 둘러감았던 팔도 풀어내었다. 이제 새슬은, 소년에게서 반 발짝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손만은, 이때까지 계속 잡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던 손만은 놓지 않고. 새슬이 고개를 들어 문하의 얼굴을 마주했다. 어쩌면 새벽 이슬같은 것이 맺혀 있을지도 모르는 눈꺼풀을 깜빡, 한 번 털어내고서. 평온한 웃음이었다.
“같이 가자, 그럼.”
그 날 밤의 내기, 기억해?
이제는 그 반대의 게임을 하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승자야.
47 문하주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4:19:10
49 새슬주 (lEXrqm8pjo)
2021-09-05 (내일 월요일) 04:22:18
내일 정신을 차렸을 때 얼굴을 들지 못하게됩니다
빨리... 빨리 묻어야만
>>48 아 그럼요 그럼요..... 이미 더 폭발당할 곳도 없거든요........(잿더미 파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