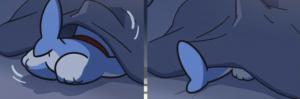>1596280094> [ALL/양과늑대/플러팅] "Bite" - eighteen :: 1001
발음조심
2021-08-19 00:36:04 - 2021-08-20 22:14:25
0 발음조심 (c0lQYglFAE)
2021-08-19 (거의 끝나감) 00:36:04
현존하는 양과 늑대는 평화롭게 풀이나 고기나 뜯고 있겠죠.
그래서 당신은 뜯는 쪽입니까, 뜯기는 쪽입니까?
하하. 뭐건 악취미네요.
선을 넘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부디, 맛있게 드세요.
※플러팅은 자유입니다.
※'수위'는 반드시 반드시 지켜주세요.
※캐조종, 완결형 금지입니다. 민감한 부분은 꼭 먼저 상대방에게 묻고 서술합시다.
※캡틴이 항상 관찰하겠지만, 혹시나 지나친 부분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웹박수로 찔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트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62093
선관/임시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63075
익명단톡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63141
웹박수 https://forms.gle/yME8Zyv5Kk6RJVsB6
이벤트용 웹박수 https://forms.gle/kcRAXMVNmfKJwAiD6
위키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Bite
마니또를 맞추신 네 분은 이번주까지 상품을 정해서 웹박수에 보내주세요~!
🌸"봄" 계절은 이번주 일요일(21일) 밤 12시까지 입니다.
155 아랑주 (tXxjUxiJ9s)
2021-08-19 (거의 끝나감) 01:46:22
157 하늘주 (QVZzrWdpCM)
2021-08-19 (거의 끝나감) 01:47:14
아무튼 다들 밤새지 말고 잘 자라구! 건강 나빠진다. 그러다가! 바이바이!
160 이현주 (R9i7/Wzcoo)
2021-08-19 (거의 끝나감) 01:48:41
>>142 후후...아랑주를 납치하러 왔습니다!
민규주 존밤존꿈!!
162 사하주 (E/M7MA/ueI)
2021-08-19 (거의 끝나감) 01:49:32
165 문하주 (AguqF7hflg)
2021-08-19 (거의 끝나감) 01:50:26
167 하늘주 (QVZzrWdpCM)
2021-08-19 (거의 끝나감) 01:50:42
하늘:......
하늘:......
하늘:아픈거 , 아픈거 멀리 날아가라.
하늘:.....///////
하늘:(집으로 냅따 도주)
이제 더 하늘이는 안 나오니 폰 떨구지 마라구. 너무 늦게 봐버렸네.
아무튼 진짜로 자러 간다!
171 새슬주 (A12zbEyB7k)
2021-08-19 (거의 끝나감) 01:51:28
따!!!!!!!!!!!!!!!
(승천!)
173 도경아 - 강해인 (eDVROMz6M.)
2021-08-19 (거의 끝나감) 01:55:44
"하긴, 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운동부족이 되었을지도 몰라. 덕분에 이곳저곳 많이 돌아다니면서 예쁜 곳들도 많이 봤는데."
어쩌면 경아가 자연풍경을 사랑하게 된 원인 중 일부분은 당신이 차지하고 있을런지도 모른다. 시원한 새벽공기와 총총히 떠있는 별, 하늘을 다채로운 색깔로 물들이는 노을도 그 한 축을 담당했지만, 그 시작을 도운 건 당신이었는지도 모른다. 매일을 당신과 손잡고 뛰어놀던 소녀는 그 청명한 웃음소리와 유유히 흘러가던 뭉게구름을 기억한다. 그 웃음소리가 없이도 하늘을, 바람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 정도로 경아에게 있어 유년시절의 추억은 소중했다. 이미 희미해져 가는 것이더라도.
"...그랬어? 아쉽네,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마지막 인사라도 건넬 수 있지 않았을까. 사라져가는 유년시절의 추억을 떠나보낼 준비라도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그리고...당신이 이렇게 바뀌기 전에 손이라도 내밀 수 있지는 않았을까. 경아는 시선을 내리깐다. 전부 이제와 떠올리기에는 늦은 생각이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
경아는 씁쓸한 기분을 덮기 위해 케이크를 한 입 잘라먹는다. 케이크는 달았다. 쓰게 느껴진다면 전적으로 기분 탓이리라.
"슬퍼할 시간도 없는 걸."
그러나 제게 닿는 온기에 경아는 환히 웃고 만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당연한 진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만들어나갈 수 있다. 당신의 말마따나 지금, 당신은 소녀의 앞에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럴 수 있기를 희망한다.
"너랑 행복하게 있기도 모자른 시간인데, 슬퍼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어깨를 으쓱여보인다. 가벼운 농조다. 그러나 그 내용마저 싱거운 농담거리는 아니다. 그러다 이어지는 말에 조금 당황한 낯빛이다. 경아의 키는 따지자면, 작은 편에 속한다. 키를 건드리는 말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지 입을 조금 삐죽거리다 만다. 그 모습이 조금 아이 같기도 하다.
"그-렇긴 하지. 어릴 적에는 분명 나름 큰 편이었던 것 같은데."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따위의 장난스런 말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175 경아주 (eDVROMz6M.)
2021-08-19 (거의 끝나감) 01:56:57
183 아랑주 (tXxjUxiJ9s)
2021-08-19 (거의 끝나감) 02:03:02
>> 147 하늘주....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달고 가심 아랑주 불안해져 버렷... 8ㅁ8 (모지?) 늑대냐고는 안 물어볼건데, 혹시 옷소매 잡고 따라다니는 거 안 좋아하는 건가요... 9흑흑) 앗 주무시러 가셨구나..!! 안녕히 주무세요!
>>150 못보고 지나친 레스도 있고, 실수도 하고, 힘들면 은근슬쩍 쉬기도 해요 ㅎㅁㅎ... 게다가 일상 돌리면 반응 일일히 못해드리는 걸요! (곰손이라서) >>해인이 연상미<< 장난 아니네요... 와... 금아랑이 너무 부러워진다... (흑흑)
>>153 ㅋㅋㅋㅋㅋㅋ 아랑이는 새슬이 은글슬쩍 믿음직스럽게 여길지도 모르겠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카지.. 우리집 대럼쥐가 새슬이한테 달라붙으려고 하면.. (금아랑 뇌에 힘 줘! >:ㅁ)
>>156 와앙.... >>문하의 눈밑에 붙여놓으니 왠지 대비가 익살스러워서 그 살풍경한 인상이 좀 덜어지는 것도 같다.<< 사실 이걸 좀 노렸는데 오늘의 문하주도 코난상을 드려야겠다... <:3 답레스는 내일 천천히 가져올게요~~ 문하가 아랑이 앞에서 약간 말랑해진 거 같아서 맘이 따수워졌어요... <:3 문하 착하다.. (스담)
>>160 (우리집 대럼쥐가 아니라 저를여 oO) (사탕 안겨드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납치해가시면 삼시세끼 먹여주시나요... (이현주 : 아니오...)
186 새슬주 (A12zbEyB7k)
2021-08-19 (거의 끝나감) 02:08:20
187 이현주 (R9i7/Wzcoo)
2021-08-19 (거의 끝나감) 02:09:30
이현:핫하하하하하하(다른 여러 사람들과 마주칠 때마다 계속 짤막하게 대화하면서도 해인이 안 놔줌)
>>183 (사탕핥핥)
군만두를 준비해놨습네다. 글만 써주시면 돼요, 자까넴.
188 문하주 (AguqF7hflg)
2021-08-19 (거의 끝나감) 02:09:37
189 해인주 (dqlzyJZLnE)
2021-08-19 (거의 끝나감) 02:11:21
191 연호주 (yyyW.PqGVY)
2021-08-19 (거의 끝나감) 02:12:26
>>174 ㅋㅋㅋㅋㅋㅋㅋㅋㅋ연호는 주변에 잘 녹아들어서 문하랑 같이 있으면 쪼끔 다운된 하이텐션(?)일것입니다! 뭐랄까 '다음은 이거다!!!' 하면서 와랄라 데리고 가는것보다는 (친하다는 가정하에)어깨동무 하고 '혼자 어디가냐? 나도 데려가~' 하면서 차분한 장난쟁이 같은 느낌?
>>183 연호가 의지가 되나요...?oO (연호 본다) (안본다) 물리적 방패로 의지가 되는건가...? (아님) ㅋㅋㅋㅋㅋㅋ아랑이랑 같이 놀이공원 가면 음청 재밌을것 같네요... 하지만 제때 밥먹으러 안가면 연호가 옆사람 물어버릴것임...(?)
192 해인주 (dqlzyJZLnE)
2021-08-19 (거의 끝나감) 02:13:33
194 아랑주 (tXxjUxiJ9s)
2021-08-19 (거의 끝나감) 02:19:12

새슬주 이현주 문하주 해인주 연호주 대댓글? 레레스...? 는 못쓰고 가는 거시지만, 여러분의 답레스를 와구와구 먹고 아랑주의 마음이 따땃해졌다... (감사의 다람쥐짤 두고감...) 여러분 모두 굿밤. 따뜻한 꿈 꾸셔요... >:3
195 새슬주 (A12zbEyB7k)
2021-08-19 (거의 끝나감) 02:20:07
아랑주도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구 나중에 뵈어요 ^.^!!
197 R E S O N (AguqF7hflg)
2021-08-19 (거의 끝나감) 02:21:57
...다시 그 자리다.
그렇지만 그때의 그 감각이 남아있을 리는 만무하다.
그 손길도, 그 웃음도, 그 온기도, 그 사람도 없이, 그저 풀벌레 우는 소리만이 찌륵찌륵 청승맞게 찬 공기를 채우고 있다.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한 줌 환상에 불과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오히려 환상이 아니라고 하는 편이 부자연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들어 그것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기억하고 있는 감각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억세고, 차갑고, 딱딱하고, 굳은살투성이인, 많이 부딪히고 많이 다치고 많이 굴러서 거칠어진, 이젠 손이라는 표현도 어색할 만큼 흉물스레 불거진... 펴져 있는 모습보다 무섭게 꽉 쥐어진 모습이 더 어울리는 그것을, 그는 펼친 채로 가만히 가슴팍 위에 올려놓았다.
늑골 속에서 희미하고 옅게 명멸하고 있는 조그맣고 약한 세동이,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고 그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지금은 그 손길도 그 온기도 그 사람도 여기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떠돌이 개는, 누군가의 온정어린 손길이 닿았던 그 자리를 잊지 못하고 그 자리를 잠잠히 맴돌았다.
198 문하주 (AguqF7hflg)
2021-08-19 (거의 끝나감) 02:22:49
원래 나메는 R E S O N A N C E
201 새슬주 (A12zbEyB7k)
2021-08-19 (거의 끝나감) 02:27:24
자캐가_자신의_과거로_회귀한다면
앞이 보이지 않던 매일, 숨 막히는 목줄.
한 모금의 숨을 위해 긁어대는 손 끝의 상처.
하필이면 왜 여기부터?
자캐가_두려워하는_것
밤, 작은 장롱 안.
좁은 틈새로 작은 달빛 한 조각도 들이치지 않았던 매정했던 날.
자캐의_내면세계_풍경은
부서진 놀이동산, 현란한 회전목마의 불빛.
다 낡아버린 플라스틱 목마를 타고 도망치는 거야.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자리를 맴돌 뿐이지만.
#shindanmaker #오늘의_자캐해시
https://kr.shindanmaker.com/977489
203 이현주 (R9i7/Wzcoo)
2021-08-19 (거의 끝나감) 02:28:35
이현: 아, 저 카페에서 마카롱 파나봐! 해인이 너 마카롱 좋아하지? 갈까?
아랑주도 문하주도 굿밤!
205 문하주 (AguqF7hflg)
2021-08-19 (거의 끝나감) 02: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