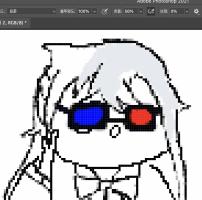0 ◆c9lNRrMzaQ (GHQUTRjm9o)
2021-05-22 (파란날) 21:17:16
참고해주세요 : situplay>1596247387>900
시트스레 :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46593
어장위키 :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EC%98%81%EC%9B%85%EC%84%9C%EA%B0%80
설문지 : https://forms.gle/ftvGSFJRgZ4ba3WP7
사이트 : https://lwha1213.wixsite.com/guardians
135 지훈주 (o49iw1GuO.)
2021-05-23 (내일 월요일) 00:21:11
136 비아 - 바다 (yJjCDDZ8ts)
2021-05-23 (내일 월요일) 00:21:26
-> [ 저도 제 뿔이 참 마음에 들어요 ]
-> [ 뿔이 있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한정된다는 부분이 걸리지만 ]
-> [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할지는 모르겠네요! ]
어...?
탈착 가능한 게 아니었어?
순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않으면 벗을 수 없는 뿔을 가지고 고민하던 얼굴 없는 여성 가디언이 딸내미가 좀 크고 의념을 각성하자 뿔을 떠넘기는 광경 같은 게 머릿속에서 그려졌다. 아니... 설마. 아무리 그래도 그 전까지 뿔 없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안 입어봤을리가... 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뿔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전개면 어머님이 사슴이셔야 하는데... 용입니다.
결국 결론은 어머님이 참 나쁜 가디언이었다... 라는걸로.
[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
라는 쪽지를 쓰고 보내려다가 또 온 두 줄의 쪽지를 보고 멈칫했다. 그리고 아래에 덧붙여 보낸다.
[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 <-
[ 아뇨, 모르는데요. ] <-
선관이 없으면... 모르는 것이다...
140 진화주 (lYrgvwym42)
2021-05-23 (내일 월요일) 00:23:46
145 카사주 (5ikNz2xbxw)
2021-05-23 (내일 월요일) 00:26:42
>>139 >>140 갓 GOD 진화주 파릇파릇한 시닙!!!!!!!!!!! 아이고 이뿌라!!!!!!!!!!!!! (부비부비부비부비) 멍청댕청 개그캐 카사를 굴리는 인텔리스토익뇌섹 카사주다!!!물어볼꺼 있으면 언제나 물어보라고!!!!
그리고 선관!!! 언제나 환영!!!! 학교 선관도 어린 시절 선관도 둘도 아닌 아브엘라 마망 선관도 환영!!!!
147 카사 - 하루 (5ikNz2xbxw)
2021-05-23 (내일 월요일) 00:28:38
하루. 그런 네가 밉다. 그런 네가 좋다.
어떠한 감정을 단정하기엔 우리가 얘기하는 몇십년은 내게 상상도 가지 않는 길이의 시간이다. 이미 두 십년을 향해 걸어가는 나에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까마득하게 멀고도 긴데, 앞으로 생각할 수십년은 또 어떨까. 누군가가 바다를 생각해도 보통 깊디 깊은 심해까지 상상력이 닿지 않는 것 처럼, 그 앞은 까마득하고도 먼 암흑 뿐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어둠속에서 길을 헤메 나아갈 것이라면, 너의 상냥한 손에 이끌려 길을 잃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옷깃을 끌어당기는 하루의 손을 바라보며 카사는 그리 생각했다.
"열심히 해야할꺼야. 나에게 네가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려면."
가디언 칩 이후로는 내 스스로 목줄을 차게 될줄이야 전혀 생각해본적 없는 데.
하루, 나는 너를 믿지 않아. 너를 믿을 수 있을 만큼 나는 너를 깊이 알지도 않고, 같이 보낸 시간도 길지 않지. 네가 말하는 감정, 그 행동, 그 모든 것을 나는 이해하지 못해. 모르는 환경에서 만난 모르는 너. 그리고 모르는 것은 무서워.
하루, 나는 네가 두려워.
그래도 지금부터 알아갈수는 있겠지. 지금부터 믿어갈수는 있겠지.
나의 목을 옥죄일 너의 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지. 시작이었으면 좋겠어. 그런 작은 소망을 담고서, 카사는 하루에게 배운데로, 작은 '기도'를 올렸다.
자신을 옷깃을 강하게 움켜진 그녀의 손에 머리를 기울여, 입술을 꾸욱, 부드럽히 누르고 떼는 식의 기도.
입술을 떼기 무섭게 하루의 몸이 카사를 따뜻히 감싸안는다. 그 온기에 기대 슬며시 눈을 내리깐다.
"많이 어려울꺼야. 그러니까 힘내, '주인님'."
어울리지 않게 장난을 치며 이가 씨익, 드러난다. 툭툭, 가볍게도 하루의 등을 한두어번 두드리고, 고개를 든다.
"...그럼 이제 보건실 가는 건 어때?"
튼튼한 워리어는! 건물 창문에서 맨몸으로 굴러 떨어져도 괜찮다!(아님) 하지만 연약한(아님) 하루는! 뼈가 몇가지 아작났다 해도 안 놀라!
// >>146 땡!!! 답레 미리 준비 했지롱!!!
148 바다 - 비아 (ka5KlULP5c)
2021-05-23 (내일 월요일) 00:28:58
바다는 가볍게 답장을 써주고는 에릭 하르트만을 모른다는 사실에 안심하였다. 만약 눈 앞의 상대가 에릭과 지인이라면, 수상할 정도로 뿔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그 둘이 서로 알고 지낸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리고 방사성 물질은 한번에 다량이 있을 수록 위험도가 제곱이 되는 법이다.
[ 그 사람도 뿔을 좋아해서 혹시 아시나 하고 여쭤봤어요 ]
154 바다주 (ka5KlULP5c)
2021-05-23 (내일 월요일) 00:30:39
하루랑 바다랑 같이 하하호호 하는걸 보여주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156 카사주 (5ikNz2xbxw)
2021-05-23 (내일 월요일) 00:31:20
161 하루주 (OZ2.67oZpE)
2021-05-23 (내일 월요일) 00:33:00
그리고 하루가 저기서 눈치없이 보건부로 갈거라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단 둘이 보낼 시간에 다른 이를 끼워넣을리가.. 후후
162 카사주 (5ikNz2xbxw)
2021-05-23 (내일 월요일) 00:33:48
만약 평범- 바다-를 아는 카사라면... 지금의 카사는 연애감정 아직 잘 몰라서 그냥 멀뚱멀뚱 쳐다본다.
아직은.
그리고 카사주는 하루의 모든 면을 애정하기에 팝콘 먹으며 허법허법 맛있게 먹는다.
167 카사주 (5ikNz2xbxw)
2021-05-23 (내일 월요일) 00:35:49
>>159 선관!!!! 내놔!! (퍼버퍽
말했다 시피! 1) 어릴적 (산속 야생아) 선관도! 2) 학교에서 만남 선관도! 3) 아브엘라 마망 선관도!! 좋아요! 혐관도 맛있게 먹슴다!!
>>161 골인 했슴다!! 우리 축하한다!!! (손잡고 덩실덩실)
169 비아주 (yJjCDDZ8ts)
2021-05-23 (내일 월요일) 00:37:06
이럴 때를 대비해서 1스레부터 샴페인을 묻어뒀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묻어야지
[땅에 묻힌 샴페인]
170 카사주 (5ikNz2xbxw)
2021-05-23 (내일 월요일) 00:37:20
>>166 카사oO(에릭 자식... 감히.... (으득)) (에릭 특: 죄 없음)
171 청천 - 진화 (25HolpEm5I)
2021-05-23 (내일 월요일) 00:37:21
힐링팩은 최소한 팀원들에게 나눠주긴 했지만...정적 일류무사를 상대할 땐 제대로 쓰진 못했었지요. 청천은 진화의 시선을 잠깐 피합니다.
"실전은...말하자면 길어요. 몹들과 싸우고...도적단도 역으로 털어보고...보물도 찾아보고, 그랬네요." (*)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 새 진화에게 덥석, 손이 붙잡힙니다.
그러자 청천은 진화의 얼굴을 보며 멋쩍은 미소를 지어보입니다.
"의뢰에 데려가 주신다면 제가 감사하죠. 저 신입생이고...힐러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음, 랜스들도 몇 명 알고 있으니 만약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시선이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마치...천사를 보는 눈빛?
부담스러운데 조금 기분 좋은...묘한 느낌에 히죽히죽 웃습니다.
// *그렇지 않았을까요.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 부분은 태양왕 게이트 클로징 후 2주간 캐릭터들이 의뢰를 열심히 뛰었다!는 설정으로 캡틴이 기존 참가자 전원의 레벨을 20으로 점핑시키신 것이기 때문이죠...
☁☁☁☁☁☁☁☁☁
172 에미리주 (atElNwnAAY)
2021-05-23 (내일 월요일) 00:37:30
카사하루 성사 축하드립니다......아 내 주식 성공했다! 드디어 성공했다!!!! 😭😭😭😭😭
180 하루 - 카사 (OZ2.67oZpE)
2021-05-23 (내일 월요일) 00:42:34
자신에게 강렬한 입맞춤을 남겨주는 카사를 홀린 듯, 바라조고 있던 하루는 자신을 끌어안는 카사의 품에 살며시 기대곤 작게 속삭인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다. 고난과 역경도 함께 따라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이젠 그것이 하루의 사랑에 제동을 걸 방해물 따위는 될 수 없었다.
" .... 카사.. "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보건실이라니, 하루는 카사를 가늘어진 눈으로 올려다보며 '이게 바로 첫 어려움인가요'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넌지시 이름을 부른다. 할말이 많은 듯, 자그마한 하루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일단 두사람의 꼴이 밖에 있을 몰골은 아니었기에 지금 당장은 입을 다물기로 마음 먹는다.
" 카사랑 제 치료는 제가 할테니꺼 저 좀 안아서 제 방 앞으로 데려다주세요, 카사. "
부탁한다는 듯, 살며시 카사의 목덜미로 파고든 하루가 살며시 입술을 맞춰주곤 나긋하게 속삭인다. 카사와 단둘이 오랜만에 보낼 시간을, 보건실에 낭비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조금 무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치료하고 말겠다는 생각을 하는 하루였다. 자신을 데려다달라는 말을 하는 것도, 이동을 하는 체력까지 긁어모아 치료를 하려는 모양이었다.
" 같이 제 방에 가서 치료 하고, 샤워도 하고, 같이 편하게 쉬기로 해요. 주인의 말, 잘 들을거죠? "
다음에 목줄도 사올까 싶네요, 하루는 고혹적인 목소리로 속삭이며 카사가 자신을 안아들기 좋게 팔로 카사의 목을 감싸안는다.
" 그럼 부탁할게요, 카사. 조금만 더 힘을 내줘요. "
181 청천주 (25HolpEm5I)
2021-05-23 (내일 월요일) 00:42:50
드디어
하루랑 카사
사귄다!!!!
축하해여!!!
>>166 단순 맞관인 거랑은 다르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 걔네...아직 안사귐!
182 비아 - 바다 (yJjCDDZ8ts)
2021-05-23 (내일 월요일) 00:43:12
그래도 불편하긴 할 것 같은데... 하지만 괜찮다고 하니 똑같은 웃는 표정을 보내면서 답장했다.
[ 저는 뿔 자체가 좋은 건 아닌걸요. 그쪽 분께서 달고 계신 걸 보니까 사슴 뿔이 되게 멋있게 느껴져서 예쁘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 <-
하고 그냥 보내려다 한 줄 더 추가...
[ 소개를 깜빡하고 있었네요. 저는 3학년 워리어인 사비아라고 해요. 그쪽 분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