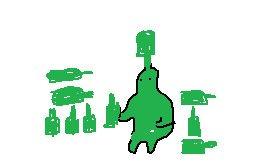>1597033420> [ALL/일상/청춘/대립] 신세기 아야카미 - 22장 :: 1001
더워! ◆.N6I908VZQ
2024-02-08 17:39:25 - 2024-02-10 19:27:48
0 더워! ◆.N6I908VZQ (3Tmnl.Ks.g)
2024-02-08 (거의 끝나감) 17:39:25
( situplay>1597033387>550 )
【 체육제 준비 기간 (휴식 시즌) 】 2月8日~2月17日
( situplay>1597033387>554 )
【 주요 공지 (필독❗❗❗) 】
❗ 오너 방학 기간
situplay>1597032992>845
❗ 체육제 팀 확인 ( 24/02/06 갱신 )
❗ 인간 한정 밸런스 수호천사 모집 ( 일단 무기한 )
❗ 인간 한정 팀 변경 신청 ~2월 10일
situplay>1597033340>826
❗ 팀 변경 기준
situplay>1597033111>939
❗ 체육제 종목 안내 및 종목별 신청자 접수(1차) ~2월 10일
situplay>1597033298>379
situplay>1597033298>387
situplay>1597033387>34
❗ 체육제 반티 투표 ~2월 17일
situplay>1597033298>597
【 찾아가기 】
학생명부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7031088/recent
예비소집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7030184/recent
이전어장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7033387/recent
웹박수 https://forms.gle/sZk7EJV6cwiypC7Q6
위키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신세기%20아야카미
360 카가리주 (69.JAi9G92)
2024-02-09 (불탄다..!) 17:59:25
ㅋㅋㅋㅋㅋㅋㅋㅋ애칭 붙여주는 거 귀엽다
스미미도 안녕~ 히데주 아야나주 나나주도 하이~
362 히데주 (b4gskbO2uM)
2024-02-09 (불탄다..!) 18:00:04
스미스미주 안녕~~! 신세기 아야카미에 아이캐치가 있다면 인어님x캇파님 여름여행풍 일러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 (˘▿˘)
363 아야카미 ◆.N6I908VZQ (XwwxZUbNns)
2024-02-09 (불탄다..!) 18:01:54
[ 호 ]로 시작하고 [ ? ]로 끝나는 웹박수
공개 웹박수인데 실수로 [공개] 말머리 떼고 보낸 것이면 웹박수로 내게 이야기해주길 바람─
364 히데주 (b4gskbO2uM)
2024-02-09 (불탄다..!) 18:04:11
카가리주 치왓스─!
설 기념 로컬라이징 버전 문수촌 if썰 보고싶어졌어
조카들의 똥꼬발랄함에 고통받는 무신님..
>>361
ㅜㅜ 아마 내일모레쯤 되면 굴러다닐듯......... 술도 잔뜩이야
371 히데주 (b4gskbO2uM)
2024-02-09 (불탄다..!) 18:14:46
>>368
앗 잠자리채 들고 다니면 되겠다 ㅋㅋㅋㄱㅋㅋㅋ 암튼 폭신맛 인어님 일상 방영 기원 6일차 🥺🥺🥺
372 아야카미 ◆.N6I908VZQ (XwwxZUbNns)
2024-02-09 (불탄다..!) 18:19:44
紅팀
사가라 테루
카와자토 아야나 인증코드 다름 확인 요망
우미 스미레
카사미츠 포피
히라사카 오토아
사토 류지
키미카게 카즈키
쿠로누마 테츠오
네코바야시 히나
아이자와 히데미
白팀
아카가네 아오이 ( 캡틴, 미참여 )
무카이 카가리
죠세 사쿠야
오토나시 시즈하
후카미 나나
사키나카 모노리 인증코드 다름 확인 요망
히무라 나기
조몬 야요이
에라키네 타시
시라카와 유우키
스즈키 토아
체육제 종목 미신청자 ( 회색은 신청 완료 ) ~2월 10일
紅팀
사가라 테루 : 나리야 / 물건 빌리기 레이스 / 계주(응원)
카와자토 아야나 : 나리야 / 물건 빌리기 레이스 / 계주(선수)
우미 스미레 : 나리야 / 계주(선수)
카사미츠 포피 : 계주(응원)
히라사카 오토아
사토 류지 : 도박묵시록 아야카미 / 계주(응원)
키미카게 카즈키
쿠로누마 테츠오
네코바야시 히나 : 나리야 / 물건 빌리기 레이스 / 계주(선수)
아이자와 히데미 : 나리야 / 물건 빌리기 레이스 / 계주(응원)
白팀
아카가네 아오이 ( 캡틴 )
무카이 카가리 : 도박묵시록 아야카미 / 물건 빌리기 레이스 / 계주(응원)
죠세 사쿠야 ( 미참가 )
오토나시 시즈하
후카미 나나
사키나카 모노리 : 계주(응원)
히무라 나기
조몬 야요이 : 도박묵시록 아야카미 / 계주(응원)
에라키네 타시 : 계주(응원)
시라카와 유우키 : 나리야 / 물건 빌리기 레이스 / 계주(선수)
스즈키 토아
반티 투표 정정하고 싶을 경우 → 나한테 문의
체육제 종목 신청 정정하고 싶을 경우 → "@1차" 달고 정정
캡틴 뭐 잘못 적었는데요 → 뭔데 말해
373 히나 - 사쿠야 (QRQWw.pMmo)
2024-02-09 (불탄다..!) 18:22:04
환각 속에서, 관짝 위에 오만하게 섰는 여신 되는 자의 모습이 주인장과 똑같다는 것보다 그 입에 새어나는 말들이 네코바야시에게는 더욱 충격이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기망하는 것은 악질적인 이간질에 불과하다. 그에 흥분하여 싸움을 벌이는 저 신도들 또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겠지. 터무니없이 비이성적이다.
강제와 폭력을 극히 혐오하는 네코바야시에게 있어, 이번 환각은 지독히도 잔인한 최저 최악의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사방에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 낭자하는 새빨간 체액, 도저히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추악한 모습들. 네코바야시는 그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은 채 어깨를 파들파들 떨며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꼴사납게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환각의 끝, 거실 마루에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주인장을 올려보는 네코바야시의 얼굴은 눈물범벅이고, 오른쪽 눈꺼풀은 반쯤 감겨 파르르 떨리고 있다. 그럼에도 소녀의 시선은 앞에 섰는 괴물의 눈을 똑바로 향하고 있더랬다.
아랫입술 피 흐를 정도로 꾹 깨물었던 입을 열면.
"당신이 범인이었군요."
"코노하나노유우카히메의 껍데기를 뒤집어쓴 괴물."
네코바야시는 이제 더 이상 신(神)이라는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제게 왜 이런 것을 보여주느냐 책망할 생각도 없다. 스스로가 희망해 벌어진 일일뿐이니.
380 아야카미 ◆.N6I908VZQ (XwwxZUbNns)
2024-02-09 (불탄다..!) 19:02:42
>>372 확인하고 투표도 신청도 모두 놓치지 않도록 하자
381 사쿠야 - 히나 (uX8ao341YE)
2024-02-09 (불탄다..!) 19:05:17

그녀를 잃음으로서 복수에 사로잡힌 악이 되었고.
복수가 끝난 이후에도 이 가증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 쓰고있는 가면이라는 이름의 기만을
들춰내기 위해 존재하고 있으니까.
"신도 인간도 요괴도 모두 겉보기 좋은 가면으로 기만을 하고 세상이라는 것을 살아가고 있잖아.
기만의 신인 내가 그 기만을 들춰낸다고 해서 신의 본질이 달리지는 건 아니지."
까마귀의 날개를 드러내며, 나는 가증스러운 꽃의 신의 가면을 벗었다.
"양인들에게는 좋은말이 하나 있던데.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 날 유키에를 잃지않았다면 내가 이런 수라의 마음을 가지게 될 일도 없었겠지.
잘못된 것은 이 세상이다. 누군가의 행복을 잃게 한다면 그런 세상 따위,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누군가 가지고 있다면
모조리 부숴주겠다고.
"그러니까 호기심에 문을 열어보는 우매한 짓은 그만뒀어야지?"
382 스미레주 (LMuL6LngNI)
2024-02-09 (불탄다..!) 19:05:53
인어들 공격 방식 : 주로 지느러미(하반신)으로 뱀처럼 휘감아 숨통을 조인다. 지느러미 비늘이 짱 딴딴하다
386 공개 웹박수 공개 ◆.N6I908VZQ (XwwxZUbNns)
2024-02-09 (불탄다..!) 19:07:59
짱친 서사 쌓고싶다
남들 눈호관 삽질하는거 구경하고 싶어요 전 구경만 할테니 님들은 사랑을 해라
호캐가 생겼어
우리 좀더 친해질 수 있을까?
Rmx
어떤 관계들이 쌓일지 자못 기대되는군 그래 🤭
388 카가리주 (69.JAi9G92)
2024-02-09 (불탄다..!) 19:08:57
스미레야내목을졸라줘.....😇👊🏻
>>385 아니 사실 많이 마시진 않았서
근데 내가 알쓰라서 취했을 뿐.......
모두 하이~
389 나나주 (KDR2j7u.rI)
2024-02-09 (불탄다..!) 19:09:18
394 사쿠야주 (uX8ao341YE)
2024-02-09 (불탄다..!) 19:15:18
그게 사쿠야한테는 딱 한사람이니 그런거고.
395 아야카미 ◆.N6I908VZQ (XwwxZUbNns)
2024-02-09 (불탄다..!) 19:19:09
>>390 당하게 해주세요당하게 해주세요당하게 해주세요당하게 해주세요당하게 해주세요
>>393 코이츠wwwwwwwwwwwwwwwwwwww
396 나나주 (KDR2j7u.rI)
2024-02-09 (불탄다..!) 19:20:57
397 아야카미 ◆.N6I908VZQ (XwwxZUbNns)
2024-02-09 (불탄다..!) 19:22:31
398 나나주 (KDR2j7u.rI)
2024-02-09 (불탄다..!) 19:24:55
399 아야카미 ◆.N6I908VZQ (XwwxZUbNns)
2024-02-09 (불탄다..!) 19:28:36
반티 투표와 종목 신청은 기한 잘 확인하고 때늦지 않게 투표 / 신청하면 되고,
만약 자칫 제 때 이벤트를 참여하지 못할 것이 걱정이면 situplay>1597033387>34 참고하고 나한테 신청을 포기하겠다고 따로 말해주면 된다. 일단 나리야와 계주는 사전 신청 없이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400 카가리주 (NcZSkPn/7Q)
2024-02-09 (불탄다..!) 19:30:21
아야카미 사람들은 언제나 이랬다는 사실을(?)
>>395 wwwwwwwwwwwwwwwww유감이지만 눈호관캐... 없읍니다
오직 덕캐만 있을뿐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w
405 아야카미 ◆.N6I908VZQ (XwwxZUbNns)
2024-02-09 (불탄다..!) 19:43:28
《 체육제 오프닝 : 나리야鳴り矢 》
카와자토 아야나
시라카와 유우키
우미 스미레
아이자와 히데미
네코바야시 히나
사가라 테루
후카미 나나
《 체육제 서브전 : 도박묵시록 아야카미 》
조몬 야요이
사토 류지
무카이 카가리
《 체육제 이벤트전 : 물건 빌리기 레이스 》
카와자토 아야나
시라카와 유우키
네코바야시 히나
무카이 카가리
사가라 테루
아이자와 히데미
《 체육제 피날레 : 계주 》
<선수>
카와자토 아야나
시라카와 유우키
우미 스미레
네코바야시 히나
<응원>
카사미츠 포피
사키나카 모노리
아이자와 히데미
조몬 야요이
사토 류지
무카이 카가리
사가라 테루
에라키네 타시
후카미 나나
407 나기 - 스미레 (u3kreb8yCU)
2024-02-09 (불탄다..!) 19:57:01
과정이야 어찌 됐든 대번에 결실이 지척이다. 씨근대던 좀 전과 달리 제법 지순히 입 벌려주니, 무르익은 열매 베어 물던 때처럼 단번에 포개어 삼켰다. 힐난 뱉어대는 근간인 주제에 네 성질만큼 독하게 달다. 구정물인 걸 알았더래도 속절없이 탐란했으리라 자부한다. 고로 한차례 책임 되풀이하자면, 금번엔 온전히 네 잘못이다.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유달리 생경했던 냄새로 유혹하니, 이 모든 변덕 뒤엎는 것도 마땅히 가당하다. 지긋이 시야 닫았다가, 가늘게 벌린 틈으로 목전을 엿봤다. 어떤 노기를 품었건 내 눈에는 마냥 애달파 보인다. 물밑에서 영세하도록 누리고 살 것이지, 구태여 뭍으로 올라 파경 겪는지 한심할 따름. 혹여나 살냄새에 홀려 스스로가 아래를 자처할지언정 위치는 명확함에, 실없이 헤픈 기대는 말았으면 한다. 너는 볕 아래서 언제까지고 무력할 테니, 주도권은 영영 내 손바닥 안이다.
위상이 깎여도 본질은 태양이라, 기질은 오만방자에 방종했다. 도섭질은 일상이요, 막무가내로 쥐여주고 빼앗은 끝에 전부가 덧없음을 깨달았다. 애지중지하던 것 기어코 품을 뿌리쳤음에 이후로 갈망 않았으나 욕망은 했다. 이지가 닫혔으니 전능은 옛일이고, 매번 눈 뜬 장님 신세다. 한시코 멀리 보지 못하는 버릇에 시야는 올곧이 지척만을 향했다. 노상 시선 끝엔 우미 스미레가 보인다. 여느 때처럼 핏대 세운 것이, 곧 달려들 형세로 비루하기만 하다. 심해가 암만 풍랑을 토해봤자 불길 잠재울 수 없음을 안다. 아니, 나 없이는 물에서 숨 쉬지 못할 테니 심해는 오늘부로 네게 과분한 지칭이다. 너는 오로지 내 곁에서 올곧이 헤엄치고 양껏 걸을 수 있다. 너는 나로 인해 자유롭다.
혀때기 위에다 상흔 덧대는 우미 스미레는 뜻밖에 폭력적이나, 나는 그마저 흔쾌했다. 스친 것뿐임에도 잠깐이나마 엮였음에 충분히 만족한다. 입술을 할짝대니 각 상처끼리 닿아 어렴풋이 쓰리다. 거듭 하순에 혀를 두어 맛을 봤다. 취중 비리고 짜다. 열상에 네 숨이라도 뱄음이 확연하다. 귓전에 들리는 건 개소리가 분명한데, 이제 귀도 먹을 때가 됐나. 심기가 은근히 혹한다.
네 성질은 더럽고, 나는 욕심낼 생각만 드글드글하니, 응당 하루도 못 가서 눈 밖에 날 것이다. 암만 막무가내로 굴지언정 네 재주로 나를 말라 죽일 수 없을 테니, 순응하는 양 고개 끄덕이는 와중에도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다.
"이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해주니 결국 기어올라?"
부스스 웃으며 손안에 목덜미 쥐여줬다. 조르던 끊어내던 네 재량이다.
"내 거 맞지?"
뒤로 물린 고개를 따라갔다. 혹여나 겹쳐진다면 진득하게 안을 휘젓겠다.
혀뿌리는 네 덕에 여지껏 비리고 끈적하다. 내벽마다 내 것으로 덧칠해줄 테니, 너 또한 만끽하기를 바란다.
408 히나 - 사쿠야 (QRQWw.pMmo)
2024-02-09 (불탄다..!) 20:07:06
"흠 많음에도 세상을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을 기만이라 폄하하지 말아주세요."
까마귀의 날개가 드러남과 동시에, 네코바야시 눈이 어둡게 가라앉는다.
가면이라는 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학교에선 세상 밝고 정의로운 풍기위원의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하교하고 나서는 헤실헤실 웃는 낯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거지 같은 집구석에 돌아오면, 가면을 벗는다.
"호기심에 들어가지 말라는 곳에 들어간 것은 거듭 죄송합니다. 가게 주인인 당신에게는 정말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부정하던 신이 존재함을 깨닫게 되었으니."
네코바야시는 고개를 내려 신의 발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인간이란, 우매한 존재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매함이 없었다면, 모두가 당신들처럼 흠 없고 자유로웠다면 작금의 세상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란 서로의 모자람을 채워주고 의지하고 발전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었다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원동력 또한 없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