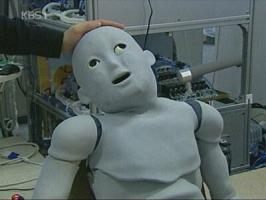>1596297086> [ALL/양과늑대/플러팅] "Bite" - Twenty_Five :: 1001
어머어머 볼에 뽀뽀한데요!! ◆Sba8ZADKyM
2021-09-04 23:48:03 - 2021-09-08 18:25:03
0 어머어머 볼에 뽀뽀한데요!! ◆Sba8ZADKyM (58t8QeZa1c)
2021-09-04 (파란날) 23:48:03
현존하는 양과 늑대는 평화롭게 풀이나 고기나 뜯고 있겠죠.
그래서 당신은 뜯는 쪽입니까, 뜯기는 쪽입니까?
하하. 뭐건 악취미네요.
선을 넘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부디, 맛있게 드세요.
※플러팅은 자유입니다.
※'수위'는 반드시 반드시 지켜주세요.
※캐조종, 완결형 금지입니다. 민감한 부분은 꼭 먼저 상대방에게 묻고 서술합시다.
※캡틴이 항상 관찰하겠지만, 혹시나 지나친 부분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웹박수로 찔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트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91097
선관/임시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84096
익명단톡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91098
웹박수 https://forms.gle/svRecK4gfgxLECrq8
이벤트용 웹박수 https://forms.gle/6Q7TyppVp8YgDDiP7
위키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Bite
현재 🏖️바다로 갑시다! 이벤트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9/12)
33 문하주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3:22:02
>>30 슬혜를 고양이라고 했었나, 정말 잘 빗댔다고 생각해. 새침하고 종잡을 수 없으면서도 이따금 살가운 모습이라고 해야 하나?
34 연호주 (m.es43TS6Q)
2021-09-05 (내일 월요일) 03:28:10
35 슬혜주 (heBC3SpGJU)
2021-09-05 (내일 월요일) 03:28:57
>>33 그리고 자주 고장나지! >:3
게다가 고양이는 자기가 아픈걸 티를 잘 안내기도 하구 의외로 외로움을 잘 탄다고 하지!
못되어먹은 부분마저 고앵이스러운 거시야...
36 슬혜주 (heBC3SpGJU)
2021-09-05 (내일 월요일) 03:33:31
(생각해보니 그렇기도 하다.)
벌써 여름에 25스레... 그래도 이번에 바뀌면서 계절 간극은 더 길어진거 같긴 하지만 생각해보니 빠르구먼,
그러니 어서 서사도 쌓고 러브라인도 쌓으라구!!!!!!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고양이의 여유인 것입니다 휴먼,
이제 친구 100명 사귀기 도전이다~~~~~!!!!!
37 연호주 (m.es43TS6Q)
2021-09-05 (내일 월요일) 03:35:55
어.... 러브라인이요? 얘가요? (연호 봄)(안봄)
._.)
_.)
.)
)
(사라짐)
38 [이벤트] 유새슬 - 문하 (lEXrqm8pjo)
2021-09-05 (내일 월요일) 03:48:38
이상하지, 생각해 보면 그리 오래 본 얼굴도 아니었는데. 곁에 있으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안정되는 기분이었다. 잡아 이끄는 손도, 이따금씩 품이나 어깨를 조용히 내어주는 것도, 내뱉는 말도.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있는 것.
몰아쳐 오는 소년이라는 이름의 파도와, 욕심이 저도 모르는 제 안을 야금거리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쳤었다. 묶고 묶이는 것은 무섭다. 사랑이나 호감이라는 이름 하에 무언가에 속박당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래서 주춤거리며 뒷걸음을 쳤었는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서 있는 곳은 다시금 소년의 품 속이다. 이상했다. 모르는 사이에 말뚝에 매여 버렸나? 자고 있는 사이에 잡혀 버렸나? 아니다. 목, 발목, 손목. 더듬어 확인해 보아도 손에 걸리는 끈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 매여있는 것 같음에도 매여있지 않은 것. 원래라면 일어야 할 혐오나 불쾌감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 보이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은 여전했다. 그러나, 글쎄. 거칠게 묶였다기보다는 소중하게 감싸안아진 것 같은 그 감각이ㅡ
너를 속박하고 싶지 않아. 여전히 얼굴은 보이지 않은 채, 잠잠히 이야기를 듣던 새슬이 두 팔을 뻗어 문하의 목덜미를 감았다. 그리곤 천천히 당겨서, 이마를 툭. 눈을 감은 채로 잠시 그렇게 있었다. 그리곤 얼마 지나지 않아 속삭임 같은 것이 흘러나왔다. 있잖아,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치만. 작게 숨을 삼킨다.
“네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색이 아닐까.”
붙어 있던 이마가 떨어졌다. 둘러감았던 팔도 풀어내었다. 이제 새슬은, 소년에게서 반 발짝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손만은, 이때까지 계속 잡았다 떨어지기를 반복했던 손만은 놓지 않고. 새슬이 고개를 들어 문하의 얼굴을 마주했다. 어쩌면 새벽 이슬같은 것이 맺혀 있을지도 모르는 눈꺼풀을 깜빡, 한 번 털어내고서. 평온한 웃음이었다.
“같이 가자, 그럼.”
그 날 밤의 내기, 기억해?
이제는 그 반대의 게임을 하자.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승자야.
47 문하주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4:19:10
49 새슬주 (lEXrqm8pjo)
2021-09-05 (내일 월요일) 04:22:18
내일 정신을 차렸을 때 얼굴을 들지 못하게됩니다
빨리... 빨리 묻어야만
>>48 아 그럼요 그럼요..... 이미 더 폭발당할 곳도 없거든요........(잿더미 파스스)
53 [이벤트] 문 하 - 유새슬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4:27:33
그렇지만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딱히 안타까워하거나 할 생각은 없다. 어차피 그 답이라는 것도 핑곗거리로 삼으려고 구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던가. 황폐하고 차가운 겨울이 드리운 황무지를 벗어날 핑계 말이다. 그렇지만 핑계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그는 늑대가 아니라 늑대개였기에 누군가의 손길을 바라고 있었던 것일 뿐이다.
새슬이 나직이 내 안에 있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 하고 말하자, 문하는 새슬의 이마를 자신의 이마에 기대어준 채로 아직도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새슬의 손을 들어서는─ 그래. 이전에 두어 번인가 했었던 일이다. 문하는 그것을 자신의 가슴팍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는다.
맥박.
평범한 맥박이다.
보통 사람과 비슷해, 별 차이를 모를 것 같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보통의 맥박이 손끝에 미세하게 와닿고 있었다.
"나도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게, 전부 너로 쓰였어."
같이 가자, 하고 말해주는 새슬을, 문하는 쥐어져 있지 않은 쪽 팔을 당겨 조심스레 끌어안았다.
"응. 이젠 함께야."
문하는 새슬에게 동행을 선물하기로 했다.
소원.
이룰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소원.
한 순간이라도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것.
링 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찾아헤매이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곳에서, 찾아내고 말았다.
58 문하주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4:41:31
60 문하주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4:47:42
( )
그런데 이제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62 문하주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4:55:21
문하: (새슬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붙으면서 질문자를 주시함)
63 새슬주 (lEXrqm8pjo)
2021-09-05 (내일 월요일) 04:58:35
그렇지만 부정하기엔 또 너무 먼 길을 왔죠.
64 문하주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5:01:28
새슬주는 얘네 둘이 커플이라고 해도 좋다고 보십니까..? (조심스레)
65 새슬주 (lEXrqm8pjo)
2021-09-05 (내일 월요일) 05:03:31
커플이냐, 아니냐로 이야기한다면 커플이라고 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오너의 시선으로는요.
66 연호주 (m.es43TS6Q)
2021-09-05 (내일 월요일) 05:03:51
후우 저는 혼자 상댕이 보면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봅니다.... ^-^ (?)
농담이구 뭐라 말해야할진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두분!! (사실 예상이야 옛날부터 했지만서도)
67 슬혜주 (heBC3SpGJU)
2021-09-05 (내일 월요일) 05:07:28
막상 커플다운 행동은 하지 않지만 헤어지거나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는건 좀 꺼려진다?
그럼 커플이 맞는 것이여~
68 문하주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5:09:26

>>66 스읍 내가 연호 관련주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연호도 앞으로 청춘빛 가득한 길을 걸을 거라고(다른 캐릭터들도 그렇듯이) 확신하고 있다구...
69 문하주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5:10:50
문하야 오늘 새슬이가 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춤추고 있는 걸 봤
아 어 그래 말 안해도 돼 표정만 봐도 알겠다... ^p^
그렇군... ^p^
70 [이벤트] 유새슬 - 문하 (lEXrqm8pjo)
2021-09-05 (내일 월요일) 05:13:12
끌어안긴 틈새로 새어나오는 웅얼거림, 은은한 웃음. 손바닥에 이어진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고동. 처음 느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그것. 하아. 팽팽하게 휘어감아 잡았던 긴장의 끈이 탁 풀리는 기분이 들어 한숨같은 숨을 내뱉었다. 덩달아 자연스레 몸에 힘도 빠져서, 이젠 영락없이 소년에게 의지해 기대 선 꼴이 되었다.
웃긴 것은, 그러고 있자니 갑작스레 졸음이 몰려 오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소년과 있을 때마다 잠에 빠져드는 것도 같다. 안정을 느끼는 탓인가. 고개를 들어 문하의 어깨에 가볍게 턱을 걸치고서, 눈을 끔뻑이며 중얼거렸다. 아, 저기 별 떴다. 그제서야 한껏 어두워진 주위의 풍경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밤하늘, 예쁘다.”
이전에도 밤하늘을 예쁘다고 느낄 만큼, 자세히 보았던 때가 있었던가? 글쎄, 어쨌든.
나른한 고개를 툭, 아마 겹쳐져 있을 문하의 고개에 마주 기대며. 풀어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 나 갑자기 졸려.
71 새슬주 (lEXrqm8pjo)
2021-09-05 (내일 월요일) 05:15:41
연호도 꼭 생길것이여
n회 커플이 될것이여.. . . . ... .!!! !
>>67 악ㅋㅋㅋㅋㅋㅋ이것도 좋은 판별법이네요 ^.^,,!!!
>>68 아이고.. 아이고 저야말로 천방지축에다 조금 이상한 우리 애를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그랜절 세번)
76 [이벤트] 문 하 - 유새슬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5:30:31
문하는 무언가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져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분명 자신의 앞에 놓여있었던 것은,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잠잠히 순응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나날들뿐이었을 텐데. 그 누구의 눈도 닿지 않는 황야에서의 아사만이 자신에게 주어진 결말이었을 텐데. 변했다. 그 모든 게 변했다. 이제 문하의 앞날은 그 스스로가 전혀 짐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상관없다.
임의의 가능성이라고 해도, 완전히 0%로 단절되어 버린 가능성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하물며 그 가능성을 너와 함께 찾아나설 수 있다면. 거기가 내 낙원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서, 새슬의 말을 따라 문득 고개를 들어본 문하는, 전에는 보인 적 없던 별들이 점점이 알알이 박힌 밤하늘을 마주했다. 눈을 깜빡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예쁘네."
이전에도 밤하늘을 예쁘다고 느낄 만큼, 자세히 보았던 때가 있었던가? 아니, 없었다. 단 한 번도, 내 인생이 퍽 괜찮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때도.
새슬이 고개를 툭 기대어오는 것이 느껴진다. 문하는 새슬을 내려다보다가, 잠깐 상반신을 숙였다. 새슬이 품 속에 기울어지도록 든 채로, 새슬의 다리에서 팔랑이고 있는 원피스 자락과 새슬의 오금을 한꺼번에 감싸서 번쩍 들어올린다. 그리곤 새슬이 자신의 품 안에 완전히 기댈 수 있도록 상반신을 뒤로 젖혀 무게중심을 맞췄다. 가볍네.
"그러면, 자러 가자."
숙소로 돌아가도 좋고, 어쩌면 어딘가 둘이서 잠들 수 있는 괜찮은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디로 가더라도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했으니까, 어디라도 괜찮을지도 모른다.
79 슬혜주 (heBC3SpGJU)
2021-09-05 (내일 월요일) 05:33:46
연호도 멋지거나 이쁜 애인이 생길겨! 그럴겨! 아니라고 해도 그에 준하는 짱친이 생길겨! 그러다보면 또 어찌저찌 무슨무슨법에 의해서 커플이 되겄지! (?)
>>74 >>75 귀여운 새럼들...
아무튼 축복하는 거시야~~~~~~~~~~~~!!!!!!!!!!!
커플지옥에 온것을 환영한다. (지옥고양이)
81 문하주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5:40:05
책임지고... 가오나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82 새슬주 (lEXrqm8pjo)
2021-09-05 (내일 월요일) 05:41:38
>>79-80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혜주도 연호주도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슈퍼스담!)
으윽 상댕ㅇㅣ 넘
귀 여 웟
83 후일담 (//EZvc8xpU)
2021-09-05 (내일 월요일) 05:47:05
철늦은 아디다스 져지를 입고 있는 그를 보고, 같은 반 아이 중 하나가 물었다. 그는 헝크러진 머리를 한 채로 동급생을 가만히 바라보다, 천연덕스럽게도 빙그레 미소지었다.
"잃어버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