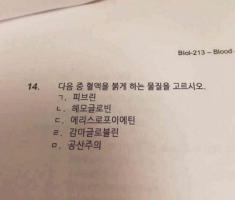0 ◆c9lNRrMzaQ (hJGj//Sm76)
2021-07-21 (水) 00:02:08
어장위키 :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EC%98%81%EC%9B%85%EC%84%9C%EA%B0%80
설문지 : https://forms.gle/h72Npp5DSLXcnXp28
사이트 : https://lwha1213.wixsite.com/guardians
정산 어장 :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48556/recent
수련장 :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61211/recent
6 ◆c9lNRrMzaQ (hJGj//Sm76)
2021-07-21 (水) 00:07:40
그들의 기대가 나의 꿈을 무겁게 했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여전히 그 눈에는 나에 대한 관심이 가득했다. 나는 그런 기대를 견디기 위해 몸을 부풀렸다. 작은 틀에 갖혀, 그저 비루하게 몸을 불린 내가 되었다.
어느 날 내가 거울을 보았을 때. 그 곳에는 거대한 살덩이 하나가 있었다. 그것은 내 눈과, 코와, 입을 달고 있었다. 한때는 흠뻑 젖어있던 기대의 물들이 빠져버리고 꿈이라는 옷을 잃어버린 뒤에야 나는 지금의 나를 볼 수 있었다.
꿈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비루해진 내 몸뚱이에 눌리면서도 힘겹게 나를 받히고 있었을 뿐. 그것을 거부한 채 몸이 무거워 살덩이를 늘린 것은 나였을 뿐이다.
나아가야만 했다.
11 ◆c9lNRrMzaQ (hJGj//Sm76)
2021-07-21 (水) 00:11:46
그는 제 가슴을 두드렸다. 텅텅, 큰 소리가 울렸다. 마치 쇠를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 글쌔. 어두운 것은 어린 너희에게 어울리지 않아. "
마치 꿈에 함몰되었던,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길 바랐기에.
" 그러니 걱정 말고 내 등을 따라와라. "
온전히 너희의 꿈을 펼쳐라.
" 러시아의 붉은 곰. 예카르가 왔다! "
너희를 짓누를 기대는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영웅상이니까.
13 다이안 - 가쉬 (JLJrlJ43Gc)
2021-07-21 (水) 00:12:09
" 아버지가 악기 하나쯤은 할 줄 알아야한다고 할때 뭐라도 배울 껄 그랬나. "
그도 그럴게 악기 살 돈도 없고 맥도날드를 포장해서 인도식 커리나 치킨티카 마살라에 햄버거를 비벼먹기 바빴으니까.
" ~~♬ "
잘 부르네. 바지만 입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좋아했을텐데. 어쩌면 바지를 안 입는게 가쉬가 이 세상에 내던지는 패널티인가..! 이 자식..
" 잘 들었다 가쉬. 소질 있네. 응. "
엄청 옛날 노래잖아 스팅. 난 학원섬에 있는 영국인이에요.
20 ◆c9lNRrMzaQ (hJGj//Sm76)
2021-07-21 (水) 00:13:47
23 지훈 - 비아 (a2WBI6TUf6)
2021-07-21 (水) 00:16:27
" 그럼 그 이외의 것 정도는 들어줄게. 아니, 내게 줘. 내가 널 존중하니, 그정도는 나를 존중해줄 수 있지? "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그정도는 존중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짐은 나눠들고 싶었다. 그 권리를 받아내고 싶어, 억지를 부려버렸다.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어느정도는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단호한 표정이 살짝 흐려지자 미소를 유지하며 비아를 빤히 바라보았다.
-
지훈은 비아를 빤히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다. 느린 숨이었다. 어느정도는 납득할 수 있었지만, 어느정도는 납득가지 않았으니까. 아니, 납득가지 않는다기보단 그저 부정하고 싶은 것에 가까웠다.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이란 원래 그런 거였으니까.
" ...응. 알았어. "
그럼에도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납득하는 감정도, 납득하지 못 하는 감정도 묻어두고, 그가 가장 잘하는 무표정으로. 그 이유는 거절당하지도 수락받지도 않았기에.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걸까. 우린 아직 어리잖아. 같은 말은 묻어둘 뿐이었다. 자신은 비아를 존중했다. 그렇다면 그녀의 방식 또한 존중하고 싶었다. 그 말 또한 무표정 뒤에 숨겼다.
가면 아닌 가면. 그 표정 뒤에, 수많은 말과 감정을 숨기고선,
첫 사랑에 대한 감정마저 숨기고선,
" 좋아. "
늘 그랬듯이 어렵게나마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이마를 맞대고선 눈을 감는다. 부드럽고,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비아를 향해 속삭였다.
" 딱 한 달만 기다려. "
눈을 떠서 바로 앞에 있을 비아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려고 했다.
"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게, "
지금은 어울리지 않더라도, 지금은 엇갈리고 말았을지라도,
지금은 조금 이르더라도.
그 때는 완벽한 화음을 이룰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29 가쉬 - 다이안 (.xWYDusCQI)
2021-07-21 (水) 00:18:59
나는 가볍게 대꾸했다. 별로, 그냥 다이안에 관한 정보의 하나로서 받아들일 뿐이다. 후텁지근한 여름 밤 작은 콘서트와 같은 짧은 연주가 끝나자 다이안은 나에게 칭찬해주었다.
"감사함다."
상대가 누구던 칭찬은 순수하게 기쁘다. 나는 헤실히죽 웃으며 감사를 표했다.
"뭐어, 그럼 주의받은 것도 있고, 저도 슬슬 들어가보겠슴다."
이 이상 바깥에 있었다간 더 모기에 물릴지도 모르고 말이지. 나는 다이안에게 꾸벅 고개를 숙이고 빈 캔을 농구하듯 포물선을 그려 캔 수거함쪽에 던져 정확히 골인시킨 뒤 방으로 돌아갔다.
//막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이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