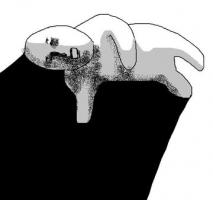>1596260206> [해리포터] 동화학원³ -14. 울음소리 :: 1001
현혹되지 마◆Zu8zCKp2XA
2021-07-09 16:40:00 - 2021-07-11 15:49:31
0 현혹되지 마◆Zu8zCKp2XA (po6z8Q/fpM)
2021-07-09 (불탄다..!) 16:40:00
2. AT는 금지! 발견 즉시, 캡틴은 해당 시트 자를 겁니다.
3. 5일 미접속시, 동결. 7일 미접속 시 시트 하차입니다.
4. 이벤트 시간은 금~일 저녁 8:00시부터 입니다.(가끔 매일 진행도 있어요)(?)
5. 본 스레의 수위는 17금입니다.
6. 위키: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EB%8F%99%ED%99%94%ED%95%99%EC%9B%90%C2%B3
7. 임시스레: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46404/recent
8. 시트스레: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59332/recent
9. 퀘스트(제한, 주의사항 확인 필수): https://www.evernote.com/shard/s662/sh/59db09c1-abb9-4df4-a670-52dd26f63be6/49de0535f7f231ed9b12ba175272cf44
10. 웹박수: https://forms.gle/mss4JWR9VV2ZFqe16
그 울음소리에 현혹되지 마라.
그 너머는 돌아오지 못하는 저편이라.
340 단태(땃쥐)주 (NGjzyCX9ts)
2021-07-10 (파란날) 05:26:31

341 주양주 (BvnPO/PMic)
2021-07-10 (파란날) 05:27:22
>>33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나는 다음턴까지는 이을 수 있는데 다다음턴까진 장담을 못 하겠구.. 팩트 인정이야 사실 해 떴으니까.. 이미 아침을 달리고 있는걸지도 몰라..! (먼산)
342 단태(땃쥐)주 (NGjzyCX9ts)
2021-07-10 (파란날) 05:27:36
343 레오(렝)주 (nQ7s9sBm96)
2021-07-10 (파란날) 05:28:27
345 주양주 (BvnPO/PMic)
2021-07-10 (파란날) 05:30:08
일단 나도 내일 일상거리 다 잇고 할 퀘스트를.. 아니 사실 지금 할 퀘스트를 신청해볼까나~!
>>0 [서 주양/몽고메리 부인의 도움 요청] 수행할게~
346 주양주 (BvnPO/PMic)
2021-07-10 (파란날) 05:31:50
>>344 후후 난 아직? 잠들지 않아야? 퀘스트 하는 첼주 모습을 보고 쭈 빙의해서 경쟁심()이 붙어버렸단 말씀%! :D 이것만 끝내고 자러 가겠어!
348 레오(렝)주 (nQ7s9sBm96)
2021-07-10 (파란날) 05:32:50
저도 어디가서 밤 잘샌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두 분은 정말 뭐랄까 어나더 레벨이랄까.. 두렵구나 쭈첼..!
349 주양주 (BvnPO/PMic)
2021-07-10 (파란날) 05:36:09
자. 오늘도 당과점에서 부인이 시켜두었던 초콜릿을 들고 올 시간이다. 달콤하고 맛있는 초콜릿. 몰래 하나 쏙 빼먹어버린다면 분명 신뢰도가 깎이고 말겠지. 그럼에도 은근슬쩍 집어먹고 싶어지는 것은, 그저 가벼운 장난기 탓이었다.
주양은 고개를 세게 저으며 잡생각을 떨쳐버렸다. 전에 애 울음소리 듣고 홀려서 숲으로 들어간것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나. 가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날이 있었다. 물론 언제는 안 그랬겠냐만은.
"자, 자! 오늘도 어김없이 몽고메리 부인께서 요청하신 초콜릿, 대신 배달해드리러 찾아왔답니다~!"
오늘도 하염없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초콜릿 상자를. 혹은 상자들을 번쩍 들었다. 언제나 그랬듯. 더위 속에 녹아버리지 않도록 빠르게, 신속하게, 압도적으로. 믿을것은 늘 자신의 탄탄한 두 다리 뿐이었다.
가져간 초콜릿 상자 갯수
.dice 1 3. = 1
350 주양주 (BvnPO/PMic)
2021-07-10 (파란날) 05:38:50
>>347 ㅋㅋㅋㅋㅋㅋㅋㅋ 땃빠땃빠~~! :D
>>348 끄아아악 그치만 나도 마지막을.. 마지막 체력을 불태우던 중이었...! (파르르)(추욱)(?) 어나더 레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그냥 잠이 심하게 없는것에 가까운 쪽이라서 어나더 레벨이라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고..! :p 후후 아무튼 두려움에 떨어라 렝주~! (???)
351 펠리체주 (jjufI2wqIU)
2021-07-10 (파란날) 05:42:56
더위는 죽기보다 싫은 그녀가 다시 물을 얻으러 현궁으로 가는데는 큰 이유가 없었다. 그냥 마땅히 할게 없으니까, 였다. 별궁에 틀어박혀 역사서를 뒤적이거나 그를 찾아가 놀아달라 하는 선택지도 있긴 했지만. 그 전에 좀 움직이고 싶어서 말이다. 몸이 살짝 뻐근하달까 뻑뻑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기에.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현궁까지 찾아간 건 좋은데 이번엔 기타도 안 들고 왔고 뭘 해야겠지 모르겠단 거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현궁의 후원으로 장소를 옮겨달라 말한다. 가는 길에 한가해보이는 현궁 학생 하나를 붙잡아 도우미로 데려와, 후원 한쪽 끝에 그 학생을 세워두고 손을 아래로 해서 도움닫기를 부탁한다.
"자, 그럼."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심호흡을 한 뒤 묘기를 선보인다. 핸드스프링, 일명 덤블링을 휙 하고 세바퀴를 돌아 손받침을 하고 있던 학생의 앞까지 가서, 그 손을 사뿐 딛고 공중 백덤블링으로 한바퀴 돈 뒤 안정적인 자세로 착지한다. 마법사가 아니라 전문 체조인 같은 묘기를 선보인 뒤 깔끔하게 인사까지 하고 웃으며 말한다.
"이번에도 목 말라서 그런데, 물 좀 주시겠어요?"
.dice 1 4. = 3
352 주양주 (BvnPO/PMic)
2021-07-10 (파란날) 05:43:18
오늘의 초콜릿 상자는 한 박스. 그렇다는 것은 부인에게 좀 더 빠르게 가져다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전처럼 맨 위에 있던 초콜릿 박스가 행여 떨어지기라도 할 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당과점 밖으로 나갈 때 까지는 여유를 유지하던 주양은, 이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학교를 향해 전력질주하기 시작했다. 바람을 가르며 내달리는 기분은 언제 느껴도 상쾌한 것이었다.
"짜잔~ 부인. 오늘도 요청하신 초콜릿 가져왔답니다! 늘 신속하고 정확한 주양퀵을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데헷. 하며 한쪽 다리를 살짝 접어들고 마찬가지로 팔도 살짝 접어서 든 채로, 선으로 브이자를 만들어 눈 옆에 가져다대며 세상 발랄한 포즈를 내보였다. 아. 이 엉성하면서도 의미없는 머글 따라하기. 의외로 재미있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353 펠리체주 (jjufI2wqIU)
2021-07-10 (파란날) 05:43:24
재주를 부려 얻어낸 물을 들고 다시 찾아간 주궁은 역시나 뜨겁고 여전히 뜨거웠다. 현궁에 있다가 와서 그런지 좀 덜한 것도 같지만, 그래도 오래 있고 싶은 곳은 아니다. 딴청 없이 신속하게 물을 전달한 후 돌아선다.
354 주양주 (BvnPO/PMic)
2021-07-10 (파란날) 05:44:46
355 펠리체주 (jjufI2wqIU)
2021-07-10 (파란날) 05:46:57
>>348 (이미 기력이 바닥난 참치입니다)(범인은 렝ㅈ)
어나더 레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긍가? 원래도 잘 새는 편이긴 했는데 어장 참여하고나선 좀 심화되긴 했지. 이게 다 동화학원이 너무 재밌어서라고~~ 아 ㅋㅋㅋ
그래서 쭈주와 렝주....안 자....? (희번득)
362 정산◆Zu8zCKp2XA (SHUw0TLJbw)
2021-07-10 (파란날) 09:55:01
' 고마워용! '
몽고메리 부인이 활짝 웃었습니다.
' 주양 학생,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된답니당! '
부인은 판 초콜릿을 지팡이로 똑, 똑,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System: 10갈레온, 기숙사 점수+10점 획득!
>>353 펠리체 W. 스피넬리
펠리체가 물을 건네자, 곤 선생님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걸로, 더위가 좀 식혀지면 좋을텐데요.
' .... '
곤 선생님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대로 몸을 돌렸습니다.
!!!System: 18갈레온, 곤의 호감도 +1, 기숙사 점수+15점 획득!
363 정산◆Zu8zCKp2XA (SHUw0TLJbw)
2021-07-10 (파란날) 09:55:46
그리고 더 이상 해당 퀘스트 진행이 어렵습니다!
367 발렌(벨)주 (Ou1tzpI0HQ)
2021-07-10 (파란날) 13:07:26
휘영주께서는 부디 현생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고, 리안주는 제가 더 챙겨드리지 못한게 아닐까 싶어 죄송하네요..일상 정말 즐거웠어요. 부족한 저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갈레온 감사해요..두분 다 행복하세요!😊
370 ◆Zu8zCKp2XA (SHUw0TLJbw)
2021-07-10 (파란날) 13:17:31
내일 쉬게 되었거든요.... :3 저번 수업 이벤트처럼 하루를 그냥 아예 통으로 쓸까 생각 중이랍니다!
아니면 시작 전까지를 일상 타임으로 잡고 이벤트로 해도 되고요:3
373 ◆Zu8zCKp2XA (SHUw0TLJbw)
2021-07-10 (파란날) 13:20:27
다이스가 이렇게 나왔네에...... 그 김에 묻겠습니다 벨주! 진지하게 대답해주세요!XD
376 ◆Zu8zCKp2XA (SHUw0TLJbw)
2021-07-10 (파란날) 13:23:52
저는 지금 진지해오! 매우매우 진지해요! 모든 캐에게 다 물어볼 거십니다:D...
379 발렌(벨)주 (Ou1tzpI0HQ)
2021-07-10 (파란날) 13:29:09
380 ◆Zu8zCKp2XA (SHUw0TLJbw)
2021-07-10 (파란날) 13:31:45

아쟁총각은 비주얼부터 놀랐었어요:D 머리에 있는 저것이 무엇이여! 하고...
381 발렌(벨)주 (Ou1tzpI0HQ)
2021-07-10 (파란날) 13:32:54
세상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맞아요...비주얼부터 해왕성 차트 1위하실 것 같은 분이세요...
382 단태-레오,주양 (H9UVSHL/Fg)
2021-07-10 (파란날) 13:35:32
"기껏해야 멍이 든 것 뿐인걸? 병동까지 가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해? 이 정도는 반나절 푹 자고 일어나면 멀쩡해질거라구?"
재잘재잘. 능글맞고 능청스럽게 대꾸하면서 단태는 레오의 눈 앞에서 흔들어보이던 두개의 손가락을 거둬들인다. "좋아. 자기야~ 다행히도 눈을 다친 것 같지는 않네. 예쁜 눈이 다치기라도 했으면 내 마음이 많이 아팠을거야." 기계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꽤 만족스러운 기색을 한껏 드러내며 단태의 손이 레오의 머리를 쓰다듬던 걸 멈추고 흉터가 있는 눈 부근을 쓸어주고는 떨어졌다. 임페리우스 저주에 당한 기억이 나질 않는 단태는 주양이 자신을 어떻게 도발했는지, 레오가 자신의 앞을 막아서자마자 그 목을 어떤 식으로 쥐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그냥 단태에게는 심하게 다친 친구와 그 친구를 부축하고 있는 또다른 친구만이 보일 뿐이었다. 주양이 걸음을 멈추자 단태도 같이 걸음을 멈춘 건 필연적이였다. 어정쩡한 자세로 재잘재잘 떠들며 부축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팔로 번쩍 레오를 안아드는 모습을 보고 단태가 헤죽 웃었다. 세상에, 자기 멋져. 라는 말은 덤이었다. 자신도 이 둘을 병동으로 데려갈 때 그랬었다는 건 아예 기억 너머로 사라지다못해 소멸된 모양이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Kitty, 나까지 안고 가면 너무 힘들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고 갈게."
어깨에 둘렀던 팔에 힘이 들어가며 단태는 주양의 등에 매달리는 것처럼 위치를 바꿨다. 그 사이 레오에게서 비명이 터져나왔고 암적색 눈동자는 그 비명에 반응이라도 하는 것마냥 옮겨졌다. 주양에게 팔을 두르고 매달려 있던 단태가 그 어깨에 턱을 대고 레오를 말끄러미 응시하다가 샐쭉- 가늘게 떴다. "레오." 단태는 덮듯이 레오의 머리 위에 다시 손을 올리려하며 꽤 다정다감하게 이름을 불렀다. 주양에게 안아들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레오, 주단태의 목소리는 레오의 목소리와 다르게 정반대의 느낌이었다.
"그건 안된다는 거, 스스로도 잘 알고 있잖아. 위로라도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말이야."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모습을 목전에 둔 사람의 태도라고 할 수 없었다. 걱정도 아니고 위로는 더더욱 아닌 말을 재잘재잘거리며 주양의 어깨에 올린 고개를 슬그머니 기울여서 레오를 바라보는 주단태의 행동은 그러했다. 애초에 위로는 생각도 없었다는 양 굴었다.
384 단태(땃쥐)주 (H9UVSHL/Fg)
2021-07-10 (파란날) 13:40:27
385 ◆Zu8zCKp2XA (SHUw0TLJbw)
2021-07-10 (파란날) 13:41:43
그런 의미에서 딴주에게도 진지하게 질문 갑니다! 단태가 들으면 당황할 머글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387 단태(땃쥐)주 (H9UVSHL/Fg)
2021-07-10 (파란날) 13:46:15
캡틴 안녕:p ((부둥둥)) 엗 땃태가 들으면 당황해할 노래.....?
다메다네 ((진지))
388 ◆Zu8zCKp2XA (SHUw0TLJbw)
2021-07-10 (파란날) 13:47:36
딴이는 다메다네....(메모메모)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