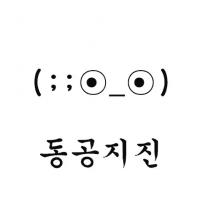>1596259865> [해리포터] 동화학원³ -09. 바다로 떠나요~! :: 1001
푸른 언덕에!◆Zu8zCKp2XA
2021-06-29 18:28:41 - 2021-07-01 21:47:59
0 푸른 언덕에!◆Zu8zCKp2XA (e3rSF/VzTQ)
2021-06-29 (FIRE!) 18:28:41
2. AT는 금지! 발견 즉시, 캡틴은 해당 시트 자를 겁니다.
3. 5일 미접속시, 동결. 7일 미접속 시 시트 하차입니다.
4. 이벤트 시간은 금~일 저녁 8:00시부터 입니다.(가끔 매일 진행도 있어요)(?)
5. 본 스레의 수위는 17금입니다.
6. 위키: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EB%8F%99%ED%99%94%ED%95%99%EC%9B%90%C2%B3
7. 임시스레: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46404/recent
8. 시트스레: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59332/recent
9. 퀘스트(제한, 주의사항 확인 필수): https://www.evernote.com/shard/s662/sh/59db09c1-abb9-4df4-a670-52dd26f63be6/ef3ce57f869a5be96ff7f0055fbe119b
10. 웹박수: https://forms.gle/mss4JWR9VV2ZFqe16
이미 사라진 리델 가문에는 두 명의 마법사가 유명하다.
하나는, 매구의 호크룩스를 만들기 위해서 본가를 멸족시킨 마법사.
다른 하나는, 동화학원의 교감선생님이다.
951 레오(렝)주 (dnCYYgGchg)
2021-07-01 (거의 끝나감) 20:34:54
952 발렌(벨)주 (c1uGylr.bA)
2021-07-01 (거의 끝나감) 20:34:58
30..도...딱 체감온도가 그정도긴 하네요...우와~ 너무 더워요...이렇게 덥다니...😭
955 민주 (QhPWJ3uJnM)
2021-07-01 (거의 끝나감) 20:37:48
ㅋㅋㅋ 그래도 막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구 주석 달려있는거 멋지더라~~~~~ 나는 남들 한거 슬쩍슬쩎 보고 따라하는 거라 그정도로 정돈 못하겠더라 흑흑흑 ㅠㅠㅠ
>>940 아앗앗,,, 보고 있었냐구~~~~~ 부끄럽지만 고마운걸 ㅎㅎ.............. 나도 벨이 꼬박꼬박 독백 올라오고 떡밥 설명해주는 거 좋더라 그 뭐지 표 정리해둔것도 ^~^
레오주 어서오고 다녀와~~~~~ 일상은 내가 방금 끝내서 쉬다가 구하고 싶네 ㅠㅠ 금방 떠나야하기도 하구,,,
956 주양주 (SPbN8gfNXA)
2021-07-01 (거의 끝나감) 20:39:20
>>949 앗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에 첼주마망 츤츤까지 완벽한데 뭐라구 밥먹기 싫어서라구..? 입맛이 없어서라거나 하는 이유가 아니라면.. 용납하지 않을지도 몰라.. (스륵)(????)
957 민주 (QhPWJ3uJnM)
2021-07-01 (거의 끝나감) 20:42:03
958 주양주 (SPbN8gfNXA)
2021-07-01 (거의 끝나감) 20:45:46
>>952 그렇구나!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D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앗 벨주가 나를 성불 못하게 막고있어..! 얼마나 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셈이지~?! (???) 그래도 도리도리하는 벨주가 귀여우니까.. 성불 안하고 오래오래 남아서 열심히 야광봉을 흔들어주겠다~!
>>955 앗 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그렇게 느껴졌다니 다행인걸!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나중에 6월 총정산 7월 총정산 이런 느낌으로 접어둘까 싶어 :p 에이 그래도 소지품이랑 기숙사 점수 딱딱 깔끔하게 나누어놨으니까! 민이 기숙사점수 같은거 보고 쭈에 빙의해서 경쟁욕심 붙을뻔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961 민주 (QhPWJ3uJnM)
2021-07-01 (거의 끝나감) 20:49:07
965 주양주 (SPbN8gfNXA)
2021-07-01 (거의 끝나감) 20:55:19
>>961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쭈의 어둠에 인격에 그만 ㅎㅎ..;; (?????) 앗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이의 당황스러운 외침이 들리지 않는건가 밍주~! 헉 좋다 세계관 최강자들의 매치다 밍이 이리와 우린 팝콘이랑 콜라 먹으면서 구경하자~! (급기야)
966 단태(땃쥐)주 (wjKU.sSkdI)
2021-07-01 (거의 끝나감) 20:55:57
969 리안주 (VYix2OABzg)
2021-07-01 (거의 끝나감) 20:58:15
아 밍어주! 찐 막레 써드릴께요!! 고거슨.... 10시 이후에 헤헤헤....
970 단태(땃쥐)주 (wjKU.sSkdI)
2021-07-01 (거의 끝나감) 20:58:37
971 민주 (QhPWJ3uJnM)
2021-07-01 (거의 끝나감) 20:59:38
972 주양주 (SPbN8gfNXA)
2021-07-01 (거의 끝나감) 20:59:51
>>963 주양: 오오. 싸운다 싸운다~ 잘 싸운다! 자, 다들 배팅타임~ 나는 저 청궁 후배가 이긴다는데 청을 걸겠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쭈는 빼박 이럴것같아.. 옆에서 막 훈수도 둘거같아 아 그거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닌데 하면서.. ()
974 ◆Zu8zCKp2XA (MGN661pyaU)
2021-07-01 (거의 끝나감) 21:00:31

일났어요 그거 한 잔 마셧다고 지금 텐션이 왜 올라가는거죠()ㅒㅑ)()()
976 리안주 (Uh.0ntl8fY)
2021-07-01 (거의 끝나감) 21:01:34
십의 빛에서 태어난 쓰다듬 너머, 선택받은 성자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숨겨진 파워풀한 쓰다듬있나니! 무는 무한이 되고, 무한의 빛에서 태어난 궁극의 손길!! 궁극땃쥐 쓰다듬!!(파워 쓰담쓰담쓰담쓰담)
(도주)
977 펠리체주 (QH6Xmumt.k)
2021-07-01 (거의 끝나감) 21:01:40
>>965 (식곤증 없는 사람) 열량이 생기면 오히려 못자는데 ㅋㅋㅋㅋㅋ 밥을 먹었으니 더 쌩쌩하게 새벽물질(?)을 할거라곤 예상하지 못 했나보군! 캡틴이 둘 다 가능하다하니 쭈주도 돌리자는 것이다~~
>>966 라져! 알았으니 느긋하게 다녀오라구~~ 더위조심...! 땃태 물놀이 별로라고 들었으니까 막으면 비켜줄때까지 기다릴걸? 같이 빠지기엔 위험하니까!
980 단태(땃쥐)주 (wjKU.sSkdI)
2021-07-01 (거의 끝나감) 21:04:13
>>977 하지만 첼주 땃태의 사투리와 약간의 빡침(???)을 보고 싶지 않아? 아니라구? 오케이...:q 천천히 써올게^^!!
982 펠리체주 (QH6Xmumt.k)
2021-07-01 (거의 끝나감) 21:06:53
>>981 세상에 동캡만큼 귀여운 사람 없다구? 맞지맞지 이거 절대 진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985 리안주 (WYjPgo7kWE)
2021-07-01 (거의 끝나감) 21:08:27
도망쳐어어어어!!
>>972 배팅이라니 히익
싸우는 상대가 자기 후배인데!!
986 ◆Zu8zCKp2XA (MGN661pyaU)
2021-07-01 (거의 끝나감) 21:09:18
일단... 몬가 엄청납니다...!!(야광봉)
>>969 건은 내기돈 걸 거고(????) 곤은 진짜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그냥 두고 감은.... 감이고 리와 무기가 그나마 사감 중에서는 상식인이니까요:3
987 민주 (QhPWJ3uJnM)
2021-07-01 (거의 끝나감) 21:10:19
아니 감은.... 감이고 이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간 덕후라 그런것인가 ㅠㅠㅠ
988 발렌(벨)주 (c1uGylr.bA)
2021-07-01 (거의 끝나감) 21:10:26
989 ◆Zu8zCKp2XA (MGN661pyaU)
2021-07-01 (거의 끝나감) 21:14:03
약간 이런 타입이라..... :3c
>>988 일단 벨주가 매우 금손인 것을 알 수 있었읍니다:3
990 서 주양 (SPbN8gfNXA)
2021-07-01 (거의 끝나감) 21:37:15
꽤 괜찮은 바다 풍경이 시야를 가득 채워나갔다. 지난 밤 실컷 느꼈던 두려움과 쪽팔림을 바닷바람에 싹 씻어 날려버리고, 이렇게 여유로운 느낌의 산책을 즐긴다는 것은 주양에게는 꼭 필요한 행복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학원에 돌아가고 나서도. 아니.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쪽팔릴것만 같다는 게 주양의 생각이었다. 좋은 추억이었다고 애써 웃으며 쪽팔림을 덮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물론 주양의 생각은 너무나도 짧아, 지금 이 행동 역시 그렇게 큰 기여를 못하는건 자각하지 못 했지만.
"으음. 역시 너무 더우려나~ 조금 쉴래?"
청에게 물을 먹여주면서 허구한 날 내기에 걸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이야기했다. 어쩔 수 없었다. 지금 자신은 가벼운 옷차림이지만 청은 깃털으로 가득 뒤덮여서 그런 느낌과는 정반대였으니까. 아무리 파랑새가 여름에 오는 새라고는 해도 더위를 못 느끼는건 아니겠거니 생각하며, 적당히 나무그늘 아래로 가 쭈그려서 앉으며 모자를 벗어 얌전히 옆에 내려놓았다.
"평화롭고. 심심하고.. 썩 좋은 기분은 아니네. 이거 뭔가, 졸리다.."
주변도 적당히 따끈하고,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칼을 휘날려 얼굴을 간지럽히는 것만 제외하면 꽤 평화롭고 잔잔한 느낌이었다. 파도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리는 갈매기의 울음소리. 모든 것이 그저 기분 좋은 자장가로 느껴졌다. 눈꺼풀이 무거워질락 말락한 것을 느끼며 무릎 사이에 얼굴을 푹 파묻었다. 청이 날아갈것같은 느김이 어깨에 전해지자, 주양은 나 안 잔다 하면서 약간의 경고를 주었다. 또 갈매기랑 쌈박질하며 시끄럽게 군다면 이 평화가 깨질 것 같았으니까.
"날아가면. 너.. 두번 다시 내기에 안 걸어버린다..?"
조금은 나른한 목소리로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 청에게 이야기를 걸었다. 정신이 몽롱한 주양은 참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새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웅얼거릴수 있는 게. 물론 주양은 청이 깩깩거리는 울음소리 따위는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지만.
991 펠리체 (QH6Xmumt.k)
2021-07-01 (거의 끝나감) 21:38:24
하고싶은게 생겼으니 남은 건 몸을 움직이는 일 뿐이다. 자느라 구겨진 옷 대신 짧은 반바지에 어깨를 드러낸 상의를 걸치고 머리는 놀 때처럼 하나로 묶었다. 이번엔 아래로 묶어 늘어뜨린게 얌전한 아가씨 같아보일지도. 옆에 붙어서 자던 리치가 그녀의 움직임에 고개를 들고 쳐다보길래 더 자라고 토닥여주고 숙소 밖으로 나갔다. 해가 저문 바깥은 해가 없는 것만으로 제법 선선했다. 너무 늦지도, 이르지도 않아 산책하기 딱 좋은 시간이었다.
해변가로 내려가니 해가 져서 그런가 낮처럼 노는 학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처럼 산책을 하나보다 싶은 사람만 한둘 보이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사람이 줄은 만큼 조용해진 해변은 낮은 파도가 오고가는 소리가 빈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납작한 샌들 밑에서는 낮의 열기를 품은 모래가 은근히 밟혀온다. 사박이는 발소리를 들으며 파도거품이 닿을락말락 하는 지점까지 다가가 바다를 잠시 지켜보다가, 그 경계를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
밀려오는 물살에 샌들이 닿을락 말락하고, 가까운 만큼 파도 소리가 선명히 들려온다. 같은 소리만 계속 듣고 있으니 그 안에 갇힌 듯한 기분을 느끼며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윤이 주세오!
992 주양주 (SPbN8gfNXA)
2021-07-01 (거의 끝나감) 21:39:11
땃주 다녀오고! 텐션 올라간 캡틴 귀여운데 내기돈 거는 건 사감님 너무 친숙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쌤 저희 친하게 지내요.. (???)
993 펠리체주 (QH6Xmumt.k)
2021-07-01 (거의 끝나감) 21:39:41
994 엘로프 - 무기 (4q5OPiJPxo)
2021-07-01 (거의 끝나감) 21:44:05
"아, 글쎄요. 잘못 맡은 것 같기도 하고. 바다 냄새였을까요."
다친 곳이 있냐 물은 상황에 곧바로 냄새를 짚어 말하는 것을 보면 짐작이 어긋나지는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무기의 어조에 당혹감이 느껴져 그 역시 얼버무리며 모르는 척을 했다. 묻지 말 걸 그랬나. 소금 냄새 밴 바다의 끈덕진 바람과 질척한 핏물의 비린내는 혼동하기가 어려울만큼 근본적으로 달랐지만, 누구에게나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은 있는 법이다.
"…전에는 가능하셨다는 뜻인가요?"
이어지는 설명에 납득했다. 아하, 역시 그래서 몰랐구나. 어찌되었든 도술 역시도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듯하니 달리 미련도 들지 않는다. 해결책이 정말로 있다한들……. 자신이 그것을 간원할지도 알지 못 하겠다. 과연 이제 와 되찾고 싶다 단언할 수 있을까? 그리한다면 희망에 안주해버릴 게 뻔한데.
"뭐 어때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저도 좀 무심한 편이고."
그는 빙긋 웃고는 의자에 걸터앉아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다. 그 상태로 무기에게 고개를 까딱 기울이더니.
"조금 미안하시면 같이 있어 주실래요? 혼자 있으려니 심심해서요."
996 주양주 (SPbN8gfNXA)
2021-07-01 (거의 끝나감) 21:44:39
999 엘로프주 (4q5OPiJPxo)
2021-07-01 (거의 끝나감) 21:46:22
나중에 감 쌤이랑도 돌려보고 싶어... 인간을 귀여워하는 선생님이 더 귀여워..... ^~^
다들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