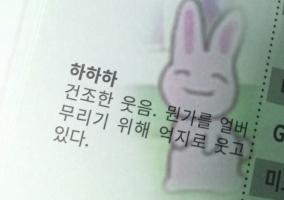>1596259777> [해리포터] 동화학원³ -07. I can't, I can't..... :: 1001
이름 없음
2021-06-26 22:24:26 - 2021-06-27 23:45:57
0 이름 없음 (KRPJtM8i.o)
2021-06-26 (파란날) 22:24:26
2. AT는 금지! 발견 즉시, 캡틴은 해당 시트 자를 겁니다.
3. 5일 미접속시, 동결. 7일 미접속 시 시트 하차입니다.
4. 이벤트 시간은 금~일 저녁 8:00시부터 입니다.(가끔 매일 진행도 있어요)(?)
5. 본 스레의 수위는 17금입니다.
6. 위키: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EB%8F%99%ED%99%94%ED%95%99%EC%9B%90%C2%B3
7. 임시스레: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46404/recent
8. 시트스레: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59332/recent
9. 퀘스트(제한, 주의사항 확인 필수): https://www.evernote.com/shard/s662/sh/59db09c1-abb9-4df4-a670-52dd26f63be6/ef3ce57f869a5be96ff7f0055fbe119b
10. 웹박수: https://forms.gle/mss4JWR9VV2ZFqe16
Hey kid, I know you can hear me.
Hey kid, I know you can see.
너 지금 나 보고 있잖아
851 ◆Zu8zCKp2XA (fr8gIOGPNE)
2021-06-27 (내일 월요일) 22:24:11
' 프로테고 '
두 번의 방어 주문이 학생들의 공격을 막아 세웠습니다. 혜향은 발렌타인의 말에 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저 마법사는 아직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 그것도 그렇ㅡ '
' 임페리오 '
' 저게 진짜...! '
마법사가 윤을 향해, 재차 조종 주문을 걸었습니다. 밧줄에서 풀린 윤이 그대로 민에게 지팡이를 겨눴고 마법사를 향해 달려들던 혜향 교수는 다시 한 번, 고통에 찬 거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 크루시오. '
또 한 번의 크루시오가, 그를 덮쳤으니까요.
' 디핀도 '
.dice 1 2. = 1
윤이, 민을 향해 주문을 날렸습니다.
머글 사냥꾼 패트릭: (6/15)
윤: (+2턴 조종)
혜향: 1턴 행동불가
//10시 50분까지 받아요!
852 단태(땃쥐)주 (2Lf/Y5FD/M)
2021-06-27 (내일 월요일) 22:24:28
>>844 마법고수(물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53 ◆Zu8zCKp2XA (fr8gIOGPNE)
2021-06-27 (내일 월요일) 22:25:01
854 엘로프주 (.Dt7DwswRw)
2021-06-27 (내일 월요일) 22:25:19
>>844 그렇게 셋이서 무림학원을 세우면서 엔딩 나는 거지.....(?)
855 ◆Zu8zCKp2XA (fr8gIOGPNE)
2021-06-27 (내일 월요일) 22:25:54
혜향이 오늘 크루시오 맞을 거라는 것 정도....?:D 몇 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요.
858 주양주 (zduA7.XXYc)
2021-06-27 (내일 월요일) 22:26:22
859 펠리체 (TaLROMlYpM)
2021-06-27 (내일 월요일) 22:26:44
아니 근데 민이!!!! 민아!!!!!!!
860 ◆Zu8zCKp2XA (fr8gIOGPNE)
2021-06-27 (내일 월요일) 22:27:52
설명한다는 거 잊었어요... :3
861 민주 (zCyAf0ZVwY)
2021-06-27 (내일 월요일) 22:28:10
앗 캡틴
???의 조각: 뱀의 비늘처럼 생겼다. 딱딱하고 굉장히 작다. 혹시 모르지. 당신을 한 번 정도 지켜줄 수 있을지도.
요거는 그럼 뭐야??? 지금 말고 따로 용도가 있는 걸까? 저번에 퀘스트 보상으로 받았는데!
862 단태(땃쥐)주 (2Lf/Y5FD/M)
2021-06-27 (내일 월요일) 22:28:11
>>854 그리고 어장의 장르는 무림학원이 되는거야??? ((아무말))
863 ◆Zu8zCKp2XA (fr8gIOGPNE)
2021-06-27 (내일 월요일) 22:28:40
864 ◆Zu8zCKp2XA (fr8gIOGPNE)
2021-06-27 (내일 월요일) 22:29:38
민이가 공격 받았을 때 한 번에 한에서 방어해주는 건데, 저한테 쓴다고 말하셔야 합니다!
865 ◆Zu8zCKp2XA (fr8gIOGPNE)
2021-06-27 (내일 월요일) 22:30:11
이거 한 명은 아닌 느낌.....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866 민주 (zCyAf0ZVwY)
2021-06-27 (내일 월요일) 22:30:49
869 리안 - 스토리 (xLvwXpEcTU)
2021-06-27 (내일 월요일) 22:31:49
"벤투스(Ventus)!!"
그의 등 뒤로 한번더 바람이 몰아친다. 이전에 이동할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몸이 바람에 실리고, 그는 그 가속력 그대로 한번 더 달려들어 그대로 팔을 크게 휘두르며 시체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체스토오오오오오오오오!!!!"
.dice 1 2. = 1
//이번엔 저도 마법 물리로 갑니다아아아ㅏㅇ아ㅏ
873 리안주 (xLvwXpEcTU)
2021-06-27 (내일 월요일) 22:33:39
그리고 캡!! 진짜 솔직하게 말해요 사실 캡의 정체는 다갓 맞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다 맞출리가 없잖아요!!
874 레오파르트 (cnJTpjWHoc)
2021-06-27 (내일 월요일) 22:34:40
" 스투페파이! "
.dice 1 2. = 1
875 ◆Zu8zCKp2XA (fr8gIOGPNE)
2021-06-27 (내일 월요일) 22:35:15
오늘 안에 끝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벤트.
878 서 주양 (zduA7.XXYc)
2021-06-27 (내일 월요일) 22:37:19
게다가 이젠 또 다시 임페리오에 맞은 백궁 선배 쪽에서도 아군 공격이 이어졌다. 조종 마법이라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중간에 낀 채 양 쪽의 상황을 지켜보는건 꽤 갑갑한 일이었다. 저 빌어먹을 마법사는 왜 하필 써도 저런것만 쓰는가. 한숨을 푹 내쉬며 다시 시선을 마법사 쪽으로 돌렸다. 일단 저 쪽을 끝장내는게 우선이다. 그대로 놔뒀다간 대체 얼마나 많은 임페리오와 크루시오를 쓸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역시 근접전보다는 1.5선 정도의 중거리에서 안전하게 화력 지원을 하는편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며, 다시 지팡이를 바로잡고 마법사에게 겨누었다.
"레라시오!"
.dice 1 2. = 1
883 펠리체 (TaLROMlYpM)
2021-06-27 (내일 월요일) 22:39:26
"칫...!"
급하게 뒤로 몸을 빼 윤에게로 돌아간다. 헛발질을 한 탓인지 계속 흐르는 피 때문인지 몰라도 몸이 살짝 무겁게 느껴졌지만 그런다고 멈출 그녀가 아니었다. 자빠질 뻔한 걸 겨우 수습해가며 윤에게 접근해 손을 든다. 잠깐 옆구리를 짚었던 손엔 붉은 피가 한가득 묻어 그새 굳어가고 있었다. 그대로 손날을 세워 윤의 뒷목을 쳐, 완전히 기절시키려 한다. 혹은 정신을 차리게 하던가.
.dice 1 2. = 1
884 민 (zCyAf0ZVwY)
2021-06-27 (내일 월요일) 22:39:32
"포르테고"
그 일련의 과정이 물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그럼에도 민은 썩 확신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야 그럴 것이 모의전을 할 일도 드물었고, 수업에서 배운 것 역시 이렇게 실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나마 아버지가 그토록 닥달해서 연습한것이 이정도였다. 만약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디핀도를 맞닥들였다가 어떤 꼴을 볼지 생각만해도 끔찍했다.
...그래, 아직 끔찍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민의 시선이 흔들렸다.
.dice 1 2. = 1
887 민 (zCyAf0ZVwY)
2021-06-27 (내일 월요일) 22:40:41
그나저나 드디어 1을 보여주는구나 다갓 흑흑 이로와 뽀뽀다 뽀보
888 주단태 (2Lf/Y5FD/M)
2021-06-27 (내일 월요일) 22:40:57
물리적인 공격이 빗나가버리자, 단태는 바닥에 발을 디디고 자세를 다시 바로잡았다. 임페리우스 저주가 한번 더 들리고, 고통에 찬 혜향 교수님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혜향 교수님이 한번 더 맞은 걸로 추측할 수 있었다.
절단 마법 주문이다. 누구를 향한? 아, 그래. 보름이다. 그러니 그쪽으로 시선이 돌아갈 일이 없지. 네 적에게 무자비하게 굴어라. 암암리에 가라앉은 암적색 눈동자에는 그 어떤 감정보다 선명하게 떠올라 있는 본성이 있었다. 광기라 일컫는 것이였다. 슬그머니 광기가 담긴 단태의 눈동자가 마법사에게 고정되었고 쥐었던 지팡이가 마법사의 목을 정황하게 겨냥했다.
"섹튬셈프라."
.dice 1 2. = 1
890 ◆Zu8zCKp2XA (fr8gIOGPNE)
2021-06-27 (내일 월요일) 22:41:18
설마 저도 낮에 든 예감이 이렇게 돌아올 거라곤 예상 못했어요....()
891 민주 (zCyAf0ZVwY)
2021-06-27 (내일 월요일) 22:42:00
그나저나 1 엄청 나오잖아 다들 멋져 ㅠㅠㅠㅠㅠㅠㅠㅠㅠ 반해버렸다 ㅠㅠ
894 엘로프 (.Dt7DwswRw)
2021-06-27 (내일 월요일) 22:42:58
시체가 말하고 움직이며 사람을 저주한다. 통상의 상식을 벗어난 말이라, 단번에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어린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지독하게 풍기는 악취, 그저 심한 부상이 방치되어 썩어버린 것일 줄로만 알았던 그것이 사실은 정교한 조작으로 움직이는 상태였다고? 숙련된 어둠의 마법사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아는 것 하나 없는 상황에서도 이번 일의 배후가, 어렴풋이 짐작되기 시작한다. 정확히는 전적이 있으니만큼 학원에 이런 난동을 부릴만한 어둠의 마법사라 하면 그들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거지만.
"아,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네요. 비위에 영……."
푸념하며 다시금 마법을 떠올린다. 투덜거리는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역시나 표정마저 평온할 수는 없었다. 전투 상황에 대한 긴장을 혐오감이 이겼다.
"임페디멘타."
.dice 1 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