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8578789> [All/판타지/일상] 축복의 땅, 라온하제 | 14.운명의 갈림길, A or B :: 1001
리온주 ◆H2Gj0/WZPw
2018-10-03 23:59:39 - 2018-10-14 01:01:42
0 리온주 ◆H2Gj0/WZPw (3116821E+5)
2018-10-03 (水) 23:59:39
☆위키 주소 -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EC%B6%95%EB%B3%B5%EC%9D%98%20%EB%95%85%2C%20%EB%9D%BC%EC%98%A8%ED%95%98%EC%A0%9C
☆웹박수 주소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ur2qMIrSuBL0kmH3mNgfgEiqH7KGsgRP70XXCRXFEZlrXbg/viewform
☆축복의 땅, 라온하제를 즐기기 위한 아주 간단한 규칙 -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EC%B6%95%EB%B3%B5%EC%9D%98%20%EB%95%85%2C%20%EB%9D%BC%EC%98%A8%ED%95%98%EC%A0%9C#s-4
"냐옹. 냐옹, 냐옹. 냐옹."
"야옹~ 야옹~ 야옹~"
-다솜에서 평화롭게 벚꽃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는 고양이 두 마리의 모습.
155 리온주 ◆H2Gj0/WZPw (2149131E+5)
2018-10-05 (불탄다..!) 22:13:06
157 리온주 ◆H2Gj0/WZPw (2149131E+5)
2018-10-05 (불탄다..!) 22:17:53
심플하게 설명을 하자면 무X도전에서 했던 YES OR NO 특집에서 따온 이벤트입니다.
159 밸린주 (3652063E+6)
2018-10-05 (불탄다..!) 22:23:59
치킨특집이로군...(확신)
165 세설 - 아사 (4157757E+5)
2018-10-05 (불탄다..!) 22:37:15
말을 걸어온 그 고대 새의 신을 세설도 알고 있었다. 그야 신들중에 특이한 이들이 많기야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아무리 트인 시각으로 봐도 망측스럽고 파격적인 의상때문에 기억에 더 깊숙히 남았었다던가. 아니면 같은 관리자라는 점이? ...뭐 그런 특징이 없었더라도 공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테지. 게다가 대화를 제대로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였잖아?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비나리에 찾아올 수도 있지."
사회성 없는 것을 티를 내야 하는 것인지. 다소 퉁명스러운 답이 날아간다. 더 이상 말할 생각은 없었으나, 마찬가지로 변덕인 것인지 심플한 답을 내놓고 다물고 있던 입에서 다른 말이 새 나온다.
"굳이 말하자면... 누군가를 찾고 있을 뿐이야."
166 아사-세설 (4143425E+6)
2018-10-05 (불탄다..!) 22:46:05
"응 그래."
딱히 별 문제가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이유라면 이유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말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는 마치 표본처럼 생기는 존재하지 않는 노란 것 같기도 하고 주황색인 것 같기도 한 묘한 눈(게다가 어느 날인가엔 검기까지 하다)이 세설을 바라봅니다.
"누구를 찾아?"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이었지만 무척이나 평이한 어조였습니다. 누군가를 찾는다고 해도 괜찮을지도. 라고 생각하며 갸웃거립니다. 그러고보니 이름도 제대로 말을 안했던가요. 라고 깨달은 듯
"이름이 뭐야?"
무던하게 물어보려 합니다.
168 세설 - 아사 (4157757E+5)
2018-10-05 (불탄다..!) 23:16:11
"카페의 알바생이...였던 고양이 신이 있어. 몇 달째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말이지."
회색 털에 초록색 눈이랑, 아마 지금도 교복 비슷한 차림일거야. 남색 베이스 교복. ...역시 백날 설명해봤자 보는 것이 직접 더 정확하겠지? 공중에 상을 띄운다. 설명대로의 생김새. 빛이 반사되지는 않지만 색이 섞여있어 화려한 홍채를 멀건히 바라본다.
"... 이름을 듣는다고 알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겠지만, 이슬비."
점장은 가랑눈에 알바생은 안개비라는 건가. 묘하게 통일성이 있으면서도 센스가 없는 이름에는, 반쯤은 세설의 책임도 있었다. 그 고양이 신의 이름, 세설이 지어줬었나?
"혹시 보거나 들은 적 있나?"
169 리스주 (0493701E+6)
2018-10-05 (불탄다..!) 23:17:38
그리고...(팝그작) 이슬비라는 이름 예뻐요...!ㅎㅎㅎ
170 세설주 (4157757E+5)
2018-10-05 (불탄다..!) 23:17:40
참고로 성씨 없이 이슬비가 전부 이름이라 슬비라고 부르면 안됩니다. 아는 사람 중에 슬비가 있어서 매우 곤란해요()
172 세설주 (4157757E+5)
2018-10-05 (불탄다..!) 23:19:48
첫 만남때 안개비가 내려서 이슬비입니다:3333
173 리온주 ◆H2Gj0/WZPw (2149131E+5)
2018-10-05 (불탄다..!) 23:23:23
174 아사-세설 (4143425E+6)
2018-10-05 (불탄다..!) 23:23: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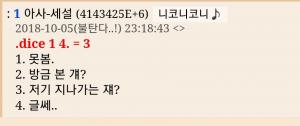
자신은 앵화영장이랑 여러 번화가 정비사업 등등을 하고 있으니.. 고양이 신이 알바를 한다는 것을 듣습니다. 들어주는 건 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더 문제에 가깝지 아니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외관설명까지 듣지만 이름이라는 것에 조금 갸웃합니다. 엇갈린 모양이군요.
"아니 네 이름."
고양이 신 이름이 그렇구나. 쓸데없는 정보는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이슬비...이슬비 하면서 상을 보고 어딜 바라보더니 저기 쟤? 라고 말해보려 합니다. 확실히 닮기는 했는데 진짜 이슬비인지는 가서 봐야 하겠군요.
"나는 아이온 피아사. 아사라고 부르면 돼...라고 소개하면 되려나."
그냥 이름 두 개를 붙인 거야. 라고 아주 덤덤하게 말을 합니다.
176 리스주 (0493701E+6)
2018-10-05 (불탄다..!) 23:33:15
그리고 다갓님...!ㅋㅋㅋㅋ(팝그작)
178 세설 - 아사 (8422257E+5)
2018-10-06 (파란날) 00:00:32
"세설, 설이라던가. 편한대로 불러."
호칭에 대한 건, 어느 쪽이든 충분했다. 아이온 피아사. 이미 알고 있던 이름이였지만 확인했다는 의미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저기 쟤라는 호칭으로 불려진 행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오.
"오."
짧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몇시간이나 찾아 헤메이던 것을 갑자기 찾아내는 것은, 그만큼 카타르시스를 남기는 법이다. 돌연적인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판단할 수 없었지?
그쪽에서도 낌새를 챈 듯이 한기에 떨며 돌아보았다. 생각치도 못한 신과 눈이 정통으로 마주쳐서였는지, 갈길을 찾지못한 초록색의 눈동자가 마구 흔들리는 것이 세설 측에서도 보이더라. 다행히 도망가기 전, 목덜미의 천을 간신히 잡는것에 성공한다. 고양이 특유의 하악질과 함께 급해보이는 어조가 튀어나왔다.
"...으햐아악!?! 점장님?!!?"
"아아... 그래, 정확히 2개월하고도 17일에 4시간 만의 재회네...?"
"뭐 그리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거 놔요!"
버둥버둥. 세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겉옷을 포기한 채로 도망치려고 하지만, 세설이 가볍게 던져낸 신통력으로 이루어진 밧줄로 인하여.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지는 고양이 신이였다. 한심한 꼴의 고양이 신을, 흘긋 바라보다가 다시 아사에게 시선을 돌려낸다.
"그래... 일단 넌 나중에 보고. ...일단 도움을 받긴 했으니 감사를 전해야겠군."
-
머리가 아파서.... 쉴게요...(우럭
179 리온주 ◆H2Gj0/WZPw (7783168E+5)
2018-10-06 (파란날) 00:02:38
182 리온주 ◆H2Gj0/WZPw (7783168E+5)
2018-10-06 (파란날) 00:05:08
183 아사-세설 (8343045E+5)
2018-10-06 (파란날) 00:10:05
동양권의 이름은 가끔 직설적인 것도 있어서 그런지. 라고 생각하고는 진짜 걔가 맞다는 것에 다행이네. 라고 하면서 내가 잘못 보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고 합니다. 물론 아사가 뭘 잘못 보았을 리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잡은 세설과 잡힌 이슬비라는 신을 보면서 팔짱을 낍니다.
"흐응. 2개월이나 못 본 사이였어?"
따땃한 관계로구나. 훈훈해야 하는 말이 아사가 하니 차갑거나 좀 냉소적인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 그나마 뜨거운이라 안한 게 다행인가.. 고양이 신을 바라보다가 감사를 전하겠다는 세설의 말에 고개 대신 바보털을 까닥였습니다.
"감사? 그렇겠구나."
깜박하고 있었어. 라고 바보털을 끄덕입니다. 무표정함이 기본인 표정에 잔잔한 물결이 일듯 희미하게 표정이 어립니다.
//푹 쉬고 오세요 세설주-
184 리스주 (9089289E+5)
2018-10-06 (파란날) 00:12:24
그리고...전 오늘은 일단 여기서 그만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해요, 레주...ㅠㅠㅠ 일상 찌를까, 했는데 역시 좀 그래서...ㅎㅎㅎ 다음번엔 꼭 찌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미리 안녕히 주무세요! XD
185 리온주 ◆H2Gj0/WZPw (7783168E+5)
2018-10-06 (파란날) 00:17:32
186 세설주 (8422257E+5)
2018-10-06 (파란날) 00:20:03
...그냥 이만 킵하고 들어갈게요ㅠ 더 깨어있다가는 큰일날 것 같아...
188 리온주 ◆H2Gj0/WZPw (7783168E+5)
2018-10-06 (파란날) 00:21:26
192 리온주 ◆H2Gj0/WZPw (7783168E+5)
2018-10-06 (파란날) 00:38:30
195 리온주 ◆H2Gj0/WZPw (7783168E+5)
2018-10-06 (파란날) 01:02:49
196 아사주 (8343045E+5)
2018-10-06 (파란날) 01:13:08
아사 : 실수는 관대하지만 거듭된, 반복되는 실수는 안돼.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어떻게 할래?"
아사 : 유감이지만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일이 없어.
"가장 증오하는 사람과 강제로 하루를 보내야 한다면?"
아사 :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야 대답이 가능한데. 없어.
https://kr.shindanmaker.com/770083
아사 대답이 참..
그렇군요..
197 리온주 ◆H2Gj0/WZPw (7783168E+5)
2018-10-06 (파란날) 01:14:11
199 아사주 (8343045E+5)
2018-10-06 (파란날) 01:19:50
그런데 그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200 리온주 ◆H2Gj0/WZPw (7783168E+5)
2018-10-06 (파란날) 01:20:14
백호:음. 글쎄? 욕은 그다지 하고 싶지 않은걸? 왜? 보고 싶어? 후훗.
"다 죽어 가는 식물을 발견한다면?"
백호:걱정하지 마. 식물아. 너는 나의 살과 피가 되어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하면 되는 상황 맞지? 그렇지? 물론 농담이야!
"네 생김새 중 가장 특이한 점은?"
백호:스스로 말하기 뭐하지만 특이한 점 없지 않아? 나는 나름 내 생김새가 예쁘다고 자부하는걸?
201 리온주 ◆H2Gj0/WZPw (7783168E+5)
2018-10-06 (파란날) 01:20:50
202 아사주 (8343045E+5)
2018-10-06 (파란날) 01:22:27
UR[크리스마스]아사
SUR[둘만의 세계]아사
SUR[아이돌]아사
UR[빛 속에서]아사
UR[괜찮아]아사
SUR[둘만의 세계]아사
UR[천사]아사
UR[할로윈]아사
SR[빛나는 눈물]아사
UR[괜찮아]아사
#애캐가챠
https://kr.shindanmaker.com/821861
맙소사 완전 혜자네!
205 세설주 (8422257E+5)
2018-10-06 (파란날) 01:34:40

생각난 김에 전에 리터칭 했던 셀피를 올려봅니다...설이 리즈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