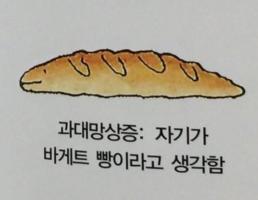>1519718725> [해리포터 기반/판타지/All] 동화학원 58. 사건 밖에 몰라 :: 1001
이름 없음◆Zu8zCKp2XA
2018-02-27 17:05:15 - 2018-02-28 05:07:22
0 이름 없음◆Zu8zCKp2XA (5373199E+5)
2018-02-27 (FIRE!) 17:05:15
*시트는 언제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캡틴에게 질문해주시길!:D
*모니터 뒤에 사람 있습니다. 네티켓을 지킵시다!
*7일 갱신이 없을 시 시트 동결, 14일 안하실 시, 해당 시트를 하차 하겠습니다.
*AT필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
*잡담을 할 때는 끼어들기 쉽고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합시다!:D
*이벤트는 금~일 사흘 간 진행되며, 보통 8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출석 체크는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D
*현재 AU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캐릭터의 현재 나이에서 7살을 더하고 일상을 돌려주세요!
*임시스레(한 번씩 읽어두시면 좋아요:D): https://goo.gl/p6oWim
*위키: https://goo.gl/xbfdr2
*시트스레: https://goo.gl/i8iuLB
*웹박수: https://goo.gl/forms/kGNkmiek9JZguo532
*동화학원 만남의 광장: https://goo.gl/EEFcpB
288 세연주 (9017344E+5)
2018-02-27 (FIRE!) 23:43:34
어차피 건강도 안 좋아져서 툭하면 피토하고 앓아눕는 분이라 머리 아픈 것 더해봤자 티도 안 날 듯합니다.
289 지애주 ◆3w3RFUIo36 (8937723E+5)
2018-02-27 (FIRE!) 23:44:24
그리고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창작물 패스가 있으니까요! 영 아니면 마블코믹스에서 맨날 하는데로 '이 세계관은 지구랑 아주 닮았지만 물리법칙은 조금 다른 평행세계 이야기임. 뭐?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괜찮아 이 세계 자연법칙은 원래 이럼ㅇㅇ'이러면 됩니다..!
제가 진짜 마블코믹스 만나고 나서 제 세계관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이 걱정이 완전 시원하게 해결됐잖아요
아니 근데 >>>>>연인이 살아있었다면 얀데레였겠지만<<<<< 이거 뭔데요...!!!
290 지애주 ◆3w3RFUIo36 (8937723E+5)
2018-02-27 (FIRE!) 23:45:46
>>288 으아닛....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갑자기 무령 수장님에게 죄송해진다)(숙연)
291 ◈뉴짤폭격기◈월하주 (7117722E+5)
2018-02-27 (FIRE!) 23:47:34
여태까지 가문 설정 제대로 짜놓은 건 없지만 얘네 가문의 죽음은 의외로 평범하기에 다 자연사 또는 병사 또는 사고사 같은 평범한 거거든요...
근데 최초의 과로사가 월하이려나......
292 세연주 (9017344E+5)
2018-02-27 (FIRE!) 23:47:44
293 ㅎㅎㅈ ◆8OTQh61X72 (2302957E+5)
2018-02-27 (FIRE!) 23:48:20
294 지애주 ◆3w3RFUIo36 (8937723E+5)
2018-02-27 (FIRE!) 23:49:09
지애를 봐요!!! 노화로 인한 자연사!!!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스레에 계신 분들 다들 좀 보고 배워요!!!!!
300 ◈뉴짤폭격기◈월하주 (7117722E+5)
2018-02-27 (FIRE!) 23:52:00
아니 얘 어차피 성인되면 카페인 과다복용으로 인한 불면증이 확정이고 카페인때문에 애가 약간 맛이 간 워커홀릭 될 예정이거든요;;;;;
애초에 그건 좀 강박적인 게 있지만... 아무튼 얘는 일을 강박적으로 하다가(하루 16시간 연속 노동, 수면시간 약 6시간(그러나 불면증으로 누워만 있고 잠들지 못하는 경우 다수), 2시간동안 여가를 즐기냐, 하면 그것도 아님)과로사할 거 확정이애오ㅇㅇ
301 부둥부둥♡햅삐 Max!★귀염둥이 니피주 •̀ω•́ (8755259E+5)
2018-02-27 (FIRE!) 23:52:08
>>274 안이 설득력 있내오...(•ㅁ•́;)
302 지애주 ◆3w3RFUIo36 (8937723E+5)
2018-02-27 (FIRE!) 23:52:09
>>297.........현호주? 아니 먼산 보지 마시고 저 좀 봐요;;;
305 쏴주는 역시~이슬톡톡~!!,!!!~! ◆9APa0haclU (2627543E+5)
2018-02-27 (FIRE!) 23:5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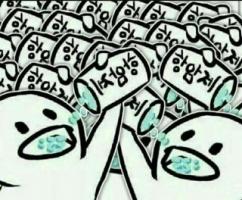
308 츠카사 - 판도라 (5935612E+5)
2018-02-27 (FIRE!) 23:55:15
"글쎄. 어느 쪽일까? 어느 쪽이었으면 좋겠어?"
능청스런 미소를 한껏 머금은채 되물었다. 아무리 그래도 간만에 재회한 외간남녀가 한 방에서 잠을 청할 수는 없는 노릇. 그래서 일부러 별채를 제공했던 것인데. 그 말을 듣고나니 내 침실에서 함께 잠을 청하는 것도 괜찮아보였다. 그녀 역시 딱히 거부할 것 같지 않았고. 따지고보면 어차피 1주일 뒤면 모든게 끝날 사람인데 거부할 여력조차 없을 것이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뺨을 꾹 꾹 찌르던 손가락을 떼어냈다. 한동안 가만히 밤하늘 같은 그 눈동자를 응시했다. 순간 어제 새벽, 그녀의 얼굴을 적신 핏물을 닦아주었던 일이 떠올라 어제와 같이 그녀의 뺨을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게으름 피우고 있을 거야?"
그녀를 놀리듯 물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그가 살아온 장소를 마주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좋든 싫든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1주일동안 내가 살아왔던 장소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어젯 밤 잠기들 전 나름대로 1주일간의 계획을 세워보았다. 일단 오늘은 그녀가 많이 피곤할지도 모르니 잠시 외출은 삼가하고 간단히 저택을 둘러보는 것도 좋겠지. 뺨을 쓰다듬던 손을 내리고 천천히 뉘었던 몸을 일으켰다. 잡아달라는듯 살며시 손을 내밀며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일어난 기념으로 머리라도 빗어줄까? 나름대로 자신있거든."
아직 땋아내리지 못한 옆머리를 천천히 어루만지며 이야기를 꺼냈다. 장난삼아 남들의 머리를 빗어준 경험밖에 없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310 지애주 ◆3w3RFUIo36 (8937723E+5)
2018-02-27 (FIRE!) 23:55:48
아니 그보다 (•ㅁ•́;)이런 이모티콘은 어디서 구해오시는거예요 가베주ㅋㅋㅋㅋㅋㅋㅋ 와 너무 귀엽다 저 진짜 이모티콘이랑 사랑에 빠진 건 또 처음인듯;;
311 쏴주는 역시~이슬톡톡~!!,!!!~! ◆9APa0haclU (2627543E+5)
2018-02-27 (FIRE!) 23:57:17
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차피 오늘 잠 못자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차게 달립니다 쏘주는 모다??????이슬톡톡이다~~~!~!!!!!,!!!!!~!,,!!!!
312 ☺동화학원 햅-삐 레인저☺ 지애주 ◆3w3RFUIo36 (8937723E+5)
2018-02-27 (FIRE!) 23:58:56

313 ㅎㅎㅈ ◆8OTQh61X72 (2302957E+5)
2018-02-27 (FIRE!) 23:59:01
315 ㅎㅎㅈ ◆8OTQh61X72 (2302957E+5)
2018-02-27 (FIRE!) 23:59:45
316 ☺동화학원 햅-삐 레인저☺ 지애주 ◆3w3RFUIo36 (6825307E+4)
2018-02-28 (水) 00:00:46
317 ☺동화학원 햅-삐 레인저☺ 지애주 ◆3w3RFUIo36 (6825307E+4)
2018-02-28 (水) 00:01:30
318 ✴섹시퇴폐 경국지색 얀데레 국민 남동생✴도윤주 (132051E+53)
2018-02-28 (水) 00:02:08

319 사라사라 - 영 (1710636E+5)
2018-02-28 (水) 00:02:35
"그래, 다행이구나."
친밀하다고 느끼는 이가 잘 지냈다니, 이만큼 다행인 일도 없었다. 이어지는 말에 나는 소리없이 웃었다.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늘 보이던 형상이 오늘따라 심했다. 적어도 밖에 나오면 따라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희미해져 기억하지 못할 법도 한데. 꼭 봐야하는 것이라면 더 좋은 모습으로 기억하고 싶었다. …마지막이 그랬던 이상 불가능한 일이다.
"…괜찮은 거니? 오늘은 쉬었어도 될텐데."
걱정스러운 얼굴로 너를 바라봤다. …아. 급하게 나 역시 오늘 만나게 되어 좋다는 말을 덧붙였다.
321 쏴주는 역시~이슬톡톡~!!,!!!~! ◆9APa0haclU (8186684E+4)
2018-02-28 (水) 00:02:55
>>314 아침 일찍 학교갔다오려구요ㅎㅎ사물함...........도서관 사물함 미리 대여해놓게....(흐릿)
324 ☺동화학원 햅-삐 레인저☺ 지애주 ◆3w3RFUIo36 (6825307E+4)
2018-02-28 (水) 00:04:00

326 사라사라 - 영 (1710636E+5)
2018-02-28 (水) 00:05:15
제인주 어서와요^♡!!!
330 ☺동화학원 햅-삐 레인저☺ 지애주 ◆3w3RFUIo36 (6825307E+4)
2018-02-28 (水) 00:06:18
332 츠카사 - 판도라 (6302434E+5)
2018-02-28 (水) 00:06:47
>>329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맛칰하심?
333 ✴섹시퇴폐 경국지색 얀데레 국민 남동생✴도윤주 (132051E+53)
2018-02-28 (水) 00:06:54

안이 츸사주 짤 뭐에여 댕귀엽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34 ㅈㅇㅈ (8133476E+5)
2018-02-28 (水) 00:06:57
335 ☺동화학원 햅-삐 레인저☺ 지애주 ◆3w3RFUIo36 (6825307E+4)
2018-02-28 (水) 00:07:30
336 판도라 - 츠카사 (5983249E+5)
2018-02-28 (水) 00:07:31
" 글쎄, 나는 어느쪽이던 상관 없지. "
어찌되던, 나는 너의 것이 되어주기로 하지 않았던가. 어젯밤 지나간 대화를 다시 천천히 되짚으며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를 정돈했다. 소리를 낼 때마다 목이 따갑고 아파왔지만, 몇 번 말을 내뱉고 나니 조금은 그 고통이 완화가 된 듯 싶더란다. 제 뺨을 쓰다듬는 손에 고개를 기울이며, 그녀가 느릿히 제 눈을 감았다 떠내었다.
" 그러게, 몸에 힘이 하나도 없네. "
하기야, 어제 그 난리가 일었으니 몸이 멀쩡히 남아날 리가 없었다. 반쯤 부서진 구두를 신고 달렸으며,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지팡이를 휘둘렀다. 몸도 마음도 멀쩡히 남아있을 리가 없었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 한 모습이란다. 평소처럼 그 입을 앙다물고 느릿히 시선만을 이리저리 옮겨내는 꼴이 꼭 잘 만들어진 인형과도 같은,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모습.
" 그래. 그거 좋겠네, 여태까지 내 머리를 빗어주는 사람은 없었거든. "
그를 따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그녀가 느릿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게 내밀어진 손은 분명 잡아달라는 의사겠지. 그 손을 맞잡으려 이불 안에서 빼낸 손이 퍽 희고 아름답더라. 그녀는 온기가 가득한 손을 맞잡으며 다시금 눈동자를 움직였다. 깔끔히 정돈 된 방안을 보니 쓰지 않는 방을 내어주었거나 별채를 제게 내준거겠지. 아직 저의 온기가 남은 이불을 쓰다듬으며,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 일주일이 지나면, 이 평화도 사라지겠네. "
내게 어울리는 결말이야. 네가 했던 말 처럼, 그녀가 해맑은 미소를 지어올렸다. 방금전까지 제가 내뱉어낸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아주 밝은 미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