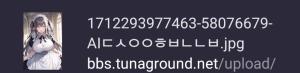>1597044376> [초능력] 초능력 특목고 모카고 R2 223.카페모카향 가을날 :: 1001
◆TMmm6tsoPA
2024-04-06 09:35:40 - 2024-04-07 19:09:55
0 ◆TMmm6tsoPA (0now59QpZE)
2024-04-06 (파란날) 09:35:40
※상황극판의 기본 규칙과 매너를 따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먼저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집시다. 모니터 너머의 이용자도 당신처럼 '즐겁고 싶기에' 상황극판을 찾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오고 가는 이에게 인사를 하는 자세를 가집시다.
※상대를 지적할때에는 너무 날카롭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15세 이용가이며 그 이상의 높은 수위나 드립은 일체 금지합니다.
※특별한 공지가 없다면 스토리는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7시 30분~8시쯤부터 진행합니다. 이벤트나 스토리가 없거나 미뤄지는 경우는 그 전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도중 반응레스가 필요한 경우 >>0 을 달고 레스를 달아주세요.
※계수를 깎을 수 있는 훈련레스는 1일 1회로, 개인이 정산해서 뱅크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훈련레스는 >>0을 달고 적어주세요! 소수점은 버립니다.
※7일 연속으로 갱신이 없을 경우 동결, 14일 연속으로 갱신이 없을경우 해당시트 하차됩니다. 설사 연플이나 우플 등이 있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존 모카고 시리즈와는 다른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기존 시리즈에서 이런 설정이 있고 이런 학교가 있었다고 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그 설정이 적용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R1과도 다른 스토리로 흘러갑니다.
※개인 이벤트는 일상 5회를 했다는 가정하에 챕터2부터 개방됩니다. 개인 이벤트를 열고자 하는 이는 사전에 웹박수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는 계수 10%, 참여하는 이에겐 5%를 제공합니다.
부원 명부: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965135
설정: https://url.kr/n8byhr
뱅크: https://url.kr/7a3qwf
웹박수: https://url.kr/unjery
위키: http://threadiki.80port.net/wiki/wiki.php/%EC%B4%88%EB%8A%A5%EB%A0%A5%20%ED%8A%B9%EB%AA%A9%EA%B3%A0%20%EB%AA%A8%EC%B9%B4%EA%B3%A0%20R2
저지먼트 게시판:https://url.kr/5wubjg
임시 스레: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244057
에피소드 다이제스트: https://url.kr/tx61ls
전판 주소: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7044339
성하제 이벤트: situplay>1597044171>905
4월 2일 0시부터 1점, 5점, 10점, 15점, 50점, -10점 6개 체제로 합니다!
594 애린주 (Mzlej/Io4k)
2024-04-07 (내일 월요일) 12:0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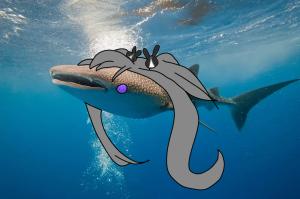
떡국이나 먹어야지... 나도 탄수화물... 히히...
596 애린주 (Mzlej/Io4k)
2024-04-07 (내일 월요일) 12:13:17
어쩐지 글귀가 눈에 익더라니... 옹달샘 혜성주 기여어...
598 혜성주 (mtQ7HeIeTI)
2024-04-07 (내일 월요일) 12:15:46
>>596 뭐좀 아시는구나
아니 진짜 별걸 다 귀여워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
601 애린주 (Mzlej/Io4k)
2024-04-07 (내일 월요일) 12:21:30
아녕~~~ 잠깨는 싸다구 맞을래오? (?)
헐 뭐야.
헐 뭐야.
이경주야.
찐이다!!! (?)
아녕 이경주 갔다와 이경주!!!
603 이경주 (zLbVKi7akY)
2024-04-07 (내일 월요일) 12:23:50
여로 2인자 하고 이경이는 일반 조직원으로 해서 비선실세 하자(?)
진짜 가요!
604 애린주 (Mzlej/Io4k)
2024-04-07 (내일 월요일) 12:26:23
>>603 호에에 비선실세 무서어... '0'
이경주 빠빠이!!! 난중에 봐!!!
605 동월주 (MxkiuB5y9A)
2024-04-07 (내일 월요일) 12:27:20
다녀십셔!!!!!!!!!!! 나중에 봐요!!!!!!!!!!!!
>>598 아마도 죽은 모닝...? (아님)
>>601 그에에에에에엑 (납작)
잠깨는 싸다구라니..... (두 렵 다!)
하지만 맞겠습니다 (?)
611 애린주 (Mzlej/Io4k)
2024-04-07 (내일 월요일) 12:33:11
.jpg)
어쨌든 죽었다... (?)
하지만 영혼이나 자아가 없다기엔 좀비감수성이 부족한 발언일거 같으므로... 🤔🤔🤔
>>605 AS YOU WISH (뚜쉬)
>>606 축축 댄스 기여어~~~ (와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박)
612 류애린 - 동 월 (Mzlej/Io4k)
2024-04-07 (내일 월요일) 12:33:31
https://ibb.co/jWVVYxn
"흐음... 확실히 서로에게도 딱히 좋은건 아니었을지두 모름다.
머, 어쩌겠슴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믄 그럴수 밖에 없는걸여."
물론 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도 없겠지만,
삶이란건 그렇게 예외를 두고싶지 않아하면서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예외가 생겨버리곤 한다.
그렇기에 단편적으로만 볼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의미에서의 플래그 브레이커였을 수도 있겠지여~"
어디까지나 장난스러운 말이었다.
"머, 그냥 성격차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속 편함다~
세상엔 꼭 깊이 파고들어 이해해야 하는 것만 있는건 아니니까여."
그렇다고 그녀가 의심암귀에 사로잡혀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조심스러울 뿐,
겉으로 보이는 그녀는 주변에 대해 신경쓰지 않을것 같고 실제로도 그렇긴 하지만, 깊이 내재되어있는 심상 속에선 자신도 모르게 눈치를 보곤 했었다.
아마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천덕꾸러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겠지.
"슨배임에겐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검다.
감정이 풍부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할만한 사람이 아닐거 같구 말이져."
그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경우였다.
"머, 사실 딱히 최악이고 아니고를 따질 생각은 없슴다. 고백의 본질은 결국 '그것이 진심이냐 아니냐'니까여...
그렇기에 지금의 즈는 슨배임의 고백을 받을수 없구...
...받아서도 안됨다."
설령 받는다 해도 상대방이 진심일 수록 더욱 악화일로를 걷겠지.
사람의 마음은 절대 무한히 생성될 수 없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잠깐은 잦아드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계의 어긋남은, 대개 그런 때를 노리고 찾아오곤 했으니까.
그렇기에...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었다.
상처입히고 싶지 않다는 모순 때문에, 도리어 상처받을 말을 꺼내게 되었다.
그래도 뒤늦게 알게 되어 배신감으로 남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절당해 서운한 편이 나을테니까,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변명거리를 만들었다.
"후회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그렇다 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어쩌면 미련이 남았던 거라고 하는게 나을지두 모르겠네여..."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는, 단념해야 할 상황일 경우엔 어쩌면 그쪽이 더 맞는 말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쩌면 정말 후회일런지도 모른다.
그 안에 있는 심상은 그녀가 감히 알 수 없는 영역이기에,
전부 이야기 해준대도 분명 말로는 꺼낼수 없는 부분이 어딘가엔 있듯,
그녀 역시 추측을 할 뿐이었다.
"꽤 많이라...
...어쩌면, 그럴지두 모르겠네여."
부정할 수 없기에 반론할 수도 없었고,
그렇기에 내심 씁쓸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정의하고 있었으니까,
내것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스스로 느낄수 없는 감정은 진짜라고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단을 내린 자신에게 있어선 거짓은 아니겠지만,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설파해봤자 그 말은 의미없이 허공을 떠돌 뿐일 테다.
"...왠지 그래야 할거 같기도 했고 말임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고백을 거절한 거지만,
...그녀도 자각 하고 있었다.
애초에 일말의 감정조차 없었다면 이러한 만남도 가지려 하지 않았을테고 무엇보다 가까워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호기심에 지극히 가까운 감정이었지만, 또 마냥 그렇다고만 할 수도 없었다.
걱정스러웠다.
물론 위험하지 않은 일이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동월은 유독 위태로워 보였다.
썩은 동앗줄이라고 해도 큰 고민 없이 잡을듯한 사람이었기에,
처음은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말을 트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는만큼, 결국엔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역시... 어려울지도..."
자신이 그러했듯 웃음을 터뜨리던 동월의 말에 그녀는 한 방 먹은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정곡을 찔린 것 같았기에, 씁쓸한 웃음이 묻어나왔을까?
나름 논리적이라 생각하고 꺼낸 말이었지만,
도리어 그런 생각이 그녀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증거가 될 뿐이었다.
스스로는 꽤나 그럴싸하게 행동하고 있을거라 여겼지만, 어디까지나 자신만의 생각일 뿐이었으니까.
"머... 정말 한 줌일지는 모를 일이지만 말임다."
괴이. 인외마경. 지옥도.
단지 그녀가 쉽게 납득했을 뿐,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선 제정신으로 임할 수 없을 것이다.
단지 그런 이질적인 것에 둔감했기도 하고, 일반적인 상식과는 동떨어져있었기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했던 걸 수도 있다.
웃음은 그대로, 손을 움직인 동월이 그녀의 손을 맞잡아 깍지를 끼고서 살며시 이마를 부딪혀왔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의문에 대해 대답해주었을까,
"...그-렇슴까~"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로 동월이 미안하다고 말한 이유였고,
그게 곧 동월이 자신을 좋아하는 증거였을테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맞았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런 소중한 것을 함부로 대할 일은 어지간하면 없을 테니까...
"......"
눈을 감고서 전하는 말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녀도 살며시 눈을 감고서 듣기로 했다.
불행이라면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행하지 않았으면 하고, 동시에 불행이라 하더라도 함께하고 싶다는 것.
그것이 좋아한다는 것일까?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사람은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
스스로 짜놓은 룰에 위배되면서까지도 마치 그게 정답이라는듯 생각하고, 행동하고, 발언 하게 되는 걸까?
그게 사랑이라는 걸까?
여전히 그녀에겐 생소한 영역일 뿐이었다.
"그것두... 그릏긴 하겠네여."
무엇이라 정의할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것을 불행이라 칭하진 않겠지.
천천히 트인 하얀 시선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단순히 맑아진 것만이 아닌, 또렷하고 온전하게 자신이 비춰지는듯한 착각이 드는 그녀였다.
감정을 모르는 사람,
감정이 넘치는 사람.
동월은 넘치는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것이라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오롯이 담기건, 그러지 못해 바닥으로 흐르건,
단지 낭비일 뿐이라 할지라도 쏟아낼 것이라 했다.
"......"
어째서 자신에게 그렇게까지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런 비효율적인 행동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 납득하게 되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게 좋아한다는 것의 정의라면, 그런 거겠지.
"슨배임... 다른 의미루다가 치사하네여..."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았기에,
죄책감이 고개를 들었다.
이기적인 사람이기에,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에,
감정을 쏟아낸다고는 했지만...
사람의 감정은 절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정도로 진심인 사람에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례가 되는건 아닐까,
허탈한 웃음과 함께 어깨가 들썩였다.
"뭐, 밑 빠진 독이었다면 제대로 담겨봤자 바닥으로 흐르는건 매한가지겠지만..."
하지만 그동안의 삶으로 미루어보건대, 그녀는 결코 밑 빠진 독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단지 깊고 깊은 구덩이일뿐, 공허는 아니었다.
하지만 동월은 알지 못할 것이다.
당연하게도, 그녀가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녀는 자신의 앞에 있는 이를 제대로 마주했다.
하얀 눈에 자신을 담아내었듯 그녀도 보라색 눈에 동월의 모습을 담아내었다.
"어쩌면... 계속 미뤄뒀던 해답을 말해줄 때가 되었을지도...
'눈은 마음의 창이다.' 라는 말..."
상당히 늦었다는건 알지만, 오해가 생기는건 싫었다.
설령 오해하지 않았더라도, 재차 확인하고 싶었다.
"감정은 만들어진 것이기에,
나 스스로도 이해할수 없는 온전한 내것이 아니기에 진짜가 될 수 없지만...
그렇게 행동하기로 정했다는 규칙은 진짜니까,
어떤 때는 화를 내기로 했고,
어떤 때는 관심을 가지기로 했고,
어떤 때는 즐기기로 했고,
어떤 때는 순응하기로 했고,
어떤 때는 슬퍼하기로 했고,
어떤 때는 고민하기로 했고,
어떤 때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적어도 자신의 행동에 정의를 내린 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이 감정의 토대였고, 그것이 표현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제게도 알려주실래요?
사람다운 마음을,
사랑하는 방법을..."
617 랑주 (zz1lkjjnlY)
2024-04-07 (내일 월요일) 12:36:45
619 수경 - 성하제 (Y6n88pcKuM)
2024-04-07 (내일 월요일) 12:37:27
situplay>1597044376>536
"...."
수경의 목소리가 들리는군요.
"손님... 죄송하지만 이런 행위는 저지먼트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상은 물론이고 나쁜 카메라..?
역시. 제지할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친절점수는 깎였다...!
625 MOKA DANCE CLUB 12기 'COTTON CANDY' (.BlD8I2x0Q)
2024-04-07 (내일 월요일) 12:40:06
성하제도 슬슬 끝을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목화고 댄스부의 공연도 마무리를 향해 간다.
마지막은 언제나 화려해야 하는 법. 끝을 앞두고 예정되지 않았던 서프라이즈 공연의 홍보가 시작되었다. 반짝이는 구름 모양 홍보지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고, 댄스부 내부에는 조금 색다른 의상의 모습이 간헐적으로 출몰한다.
그리고 가장 사람이 많이 오갈 시간, 교문 앞.
보다 화려할 마지막 공연을 미리 예고하는 사복 차림의 게릴라 댄스가 막을 올린다.
626 MOKA DANCE CLUB 12기 'COTTON CANDY' (.BlD8I2x0Q)
2024-04-07 (내일 월요일) 12:40:44
https://www.youtube.com/watch?v=6KIuzXYR16Y
627 리라주 (.BlD8I2x0Q)
2024-04-07 (내일 월요일) 12:41:16
이거지ye!!!!!!!!!
내주식떡상!!!!!!! 드디어 외칠 수 있다!!!!!!!!!!
629 태오주 (fVv//boJPw)
2024-04-07 (내일 월요일) 12:41:38
아주조아요 < 기력 없어서 독백 못 쓸 것 같아 우는 비얌
630 수경 - 성하제 (Y6n88pcKuM)
2024-04-07 (내일 월요일) 12:43:27
situplay>1597044376>621
"단짠한 거 추천해주세요."
라는 손님께 진짜 단짠한 거 드렸습니다. 수경의 입맛에도 딱 달다. 짜다. 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었네요.
".....!!!"
초고용량 단짠이 와서 손님은 당혹스러운 것 같았지만 인첨공이니까 가능한 것이라고 여기고는 먹은 모양입니다...
그래도 한입크기라서 점수를 깎진 않으셨어요.
//다들 어서오세요.
631 리라주 (.BlD8I2x0Q)
2024-04-07 (내일 월요일) 12:43:48
공연레스 쓴다면 아기뱜미의 길티챌린지를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관객반응
634 태오주 (fVv//boJPw)
2024-04-07 (내일 월요일) 12:45:39
의상은 그거일까? 그
내가 새벽에 발언한 정장 속의 더보기와 포니테일 현태오?😏
638 리라주 (LMVtCwwxh.)
2024-04-07 (내일 월요일) 12:47:34
소환
5호다!!!!!!
>>634 😏😏😏 네 맞아요 바로그겁니다
후후후 후후후후후
후후(???)
매콤하게 2부 시작하고 끝날때 솜사탕댄스로 마무리해야지
완벽한 풀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