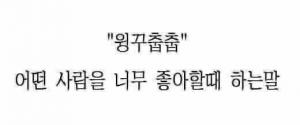>1596436067> [all/일상/느와르] people has no remorse - 31 :: 1001
◆RCF0AsEpvU
2022-01-25 19:36:44 - 2022-01-26 15:53:47
0 ◆RCF0AsEpvU (J1v1elPbMU)
2022-01-25 (FIRE!) 19:36:44
깨어질 것 같이 미칠 것 같이
괴로운 밤에는 몰래 안고
아무도 없는 방 네가 없는 방
괴로운 밤에는 그렇게 중얼거렸어
※ 본 스레는 17금 수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수위가 과하다고 생각 될 시 1회 경고 후 시트가 즉각 내려질 수 있습니다.
※ AT필드(따돌림)를 절대적으로 금합니다.
※ 어두운 세계관이지만 밝은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 서로 서로 인사합시다.
※ 아리송한 부분이 생기면 캡틴에게 질문합시다. 물지 않아요!
1. 본 스레는 놀기위해 오는 거다 공부는 필요 없다.
2. 일상 중 불편하게 느낄 것 같은 사항이 있다면 사전 조율한다.
3. 본인이 뭐가 아니라고 느껴지면 웹박으로 쏘거나 넌지시 그리고 확실하게 상대에게 전달한다.
위키 https://bit.ly/3EI7TkW
웹박수 https://bit.ly/3pyCTjh
임시스레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405078
시트스레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412081
T/ash:Ta/k
https://bbs.tunaground.net/trace.php/situplay/1596417079/recent
3 브리엘주 (Z/AwmJVurg)
2022-01-25 (FIRE!) 20:30:56
>>996 그럼에도 하지 못하는 선관도 있기는 하지만. (쓰담)
>>997 아, 귀여워. 요시요시 (쓰다듬)
5 이리스 - 아스타로테 (hRWSNKkP0.)
2022-01-25 (FIRE!) 20:34:47
이리스는 스르륵 잠들어 있던 쇼파에서 몸을 일으킨다. 요즘 들어 딱히 밖을 잘 나가지 않고 이렇게 그저 늘어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다. 결근을 하니 덩달아 하는 일도 없어지고, 그저 스텔라가 어딘가에 다녀올 때 몇번인가 따라다니는 것이 다였다. 그동안의 삶의 목적을 포기하니, 자연스레 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리. 하지만 한통의 문자가 전해졌을 때, 이리스의 눈이 커질 수 밖에 없었고, 그럴만한 문자였다.
" 가야하나..? 하지만 그럼 아스 언니랑 봐야할텐데.. "
분명 다시 얼굴을 마주 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왠지 겁이 난다. 아니, 겁이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리스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마주하는 날이 두사람이 얼굴을 마주 하는 마지막 날이라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피하고만 싶었다. 하지만 이 문자는, 응하지 않으면 다신 얼굴을 마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문자였다.
" .....어쩔 수 없잖아.. "
먼저 발길이 떨어질 때, 찾아가고 싶었지만 이래서야 별 수 없었다. 결국 쇼파 앞 바닥에 나뒹굴던 검정색 가죽 셔츠를 새햐안 셔츠 위에 걸치곤 몸을 일으킨다. 이대로 소집에 응했다간 무단 이탈에 대한 무언가를 치르게 될지도 몰랐지만, 그래도 더이상 아스의 얼굴을 못 보는 것도 싫었다. 부하들은 일단 다른 팀에서 움직이고 있단 사실을 문자로 들었기에 걱정은 없었지만, 마음이 정해진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스텔라의 집에서 빠져나와 라 베르토의 잡화점으로 향했다.
딸랑거리는 소리, 언제나 귀에 익었던 소리임에도 지금은 낯선 그 소리를 귀에 담은 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선 이리스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분위기라도 살피려는 듯.
7 페퍼주 (I0xRmZ7tdA)
2022-01-25 (FIRE!) 20:37:03
페로사 답레 잇다보니 문득 생각난건데, 피피가 페퍼한테 직접 '피피' 라는 이름으로 소개한 적이 있었던가
그보다 통성명도 제대로 안한거같다는 기분이 드는데 :/ 기억력이 영 안좋아서 확인이 필료해
11 쥬주 (2MbiuOvTXg)
2022-01-25 (FIRE!) 20:42:05
쓰담 좋다~~ 맞쓰담이다~ 하하~ (쓰담쓰담)
>>4 도돈~ 돈까스~ (?)
12 피피 - 캄파넬라 (0bj.Tan7sI)
2022-01-25 (FIRE!) 20:43:03
어깨를 으쓱였다.
"자, 다 됐어. 일어나도 좋아."
비척거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오늘은 확실히 밤을 새야 쓰겠다. 안 그러면 시간 내에 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시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급락한다. 반토막난 쪽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른 쪽은 어떻게든 '무언가'라도 해야 쓰지 않겠는가.
"뭐.. 나야 편하지만.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되더라도 그건 내 책임으로 돌리면 곤란해."
괜히 쓸데없는 곳에서 트집잡는 고객들이 있다. 프로스페로는 그런 인간들에게 이골이 난 상태였다.
"그럼 내일 이 두 친구 데리러 오는 김에 청구서랑.. 계산서 하나씩 챙기는 걸로 하자고."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캄파넬라에게 던졌다.
"커피 싫으면 이거나 먹어."
사과사탕이다.
17 에만주 (zlyPTqPdeQ)
2022-01-25 (FIRE!) 20:46:00
"형제 자매 모두 들었는가?"
"들었습니다, 따거."
"그렇다면 모두 증인이겠군. 지금부터 내 죄인을 심문할 터이니 모두 듣고 판단하라. 대답은 내가 지목하기 전까지 오로지 예와 아니오로 정해진다. 알아들었나."
"예!"
**
"지금 우리는 낙원의 이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지. 세력도 제대로 안 된 쭉정이의 싹을 치려 했다 이 말이야. 헌데 이 상황에서 녀석들의 명을 받고, 의도하지 않은 일로 분쟁을 만들어서, 그 틈새를 노려 내 세력을 깎아내려 했던 것이라고 했다면. 그마저도 아니면 내 위신을 소량 떨어트려 민심을 떨구고 천천히 고립시킬 상황을 고려했다면 차라리 내가 납득을 했을 게야. 멍청한 짐승을 고용한게 아니라 대가리 굴러가는 사람을 고용했다 생각해 덜 후회했을 테니."
**
"판결의 시간이다. 이 자는 죄인인가?"
"예!"
"사형시켜 마땅한가?"
"예!"
"하면 환호하라. 내 흥이 떨어졌으니."
조직원이 눈치를 보다 작게 환호를 시작했다. 용왕이 죄인의 머리채를 쥐어잡자 목소리는 점점 고양되기 시작했고 용왕이 비수를 들어올리자 일제히 환성을 내질렀다. 짐승이 덫에 걸려 몸부림 치듯 찢어지는 비명소리는 환성에 묻혔다. 연 씨는 이 자리에서 투기장에서나 느꼈던 광기를 떠올렸다.
**
"형제 자매는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
"예!!"
"모두 동의한 것이다. 우리는 피를 나누지 않았으나 형제요 자매인즉, 그 누구도 용궁을 배신할 수 없으니, 이 모습을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겸손과 순종의 미덕을 새겨두도록."
🤔
19 페퍼주 (I0xRmZ7tdA)
2022-01-25 (FIRE!) 20:46:56
여하간 꼬마어 피피주 ~~
23 페로사주 (nMLxuTrQT6)
2022-01-25 (FIRE!) 20:48:24
(그러나 칙 하고 마개를 따버린 페로사주는 습관성 완샷을 쌔려버리고 마는데.)
24 에만주 (zlyPTqPdeQ)
2022-01-25 (FIRE!) 20:49:52
>>23 우우우.....(뽀다다담)
..건조기 끝났다.. 에만주 집안일.. 싫다 우우.. 잠깐 다녀올게..🥺
26 브리엘주 (Z/AwmJVurg)
2022-01-25 (FIRE!) 20:51:18
피피주의 감성 귀여워ㅋㅋㅋㅋㅋㅋㅋ짤 진짜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페로사주는 오늘 일찍 잠들기 글렀군)
27 페로사주 (ln9e3rUnuM)
2022-01-25 (FIRE!) 20:52:08

28 쥬주 (2MbiuOvTXg)
2022-01-25 (FIRE!) 20:52:35
에만주 토막글 맛있다~~ 최고야~~
건조기에 돌아간 빨래~ 조심히 다녀오거라~
29 페퍼 - 페로사 (I0xRmZ7tdA)
2022-01-25 (FIRE!) 20:52:36
돌격하는 보병과 그것을 도륙하는 기관총, 인골이 산을 이루는 매장지… 이런 것들을 보고도 신앙심을 잃지 않기란 제법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신이 실재하고, 눈 앞에 서있다면 어떨까? 그것은 비록 참된 신앙심은 아닐지언정, 최소한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그의 작은 신이 작게 고갯짓 했다.
"재촉할 필욘 없겠지."
그건 이미 시작된 듯 하니까. 들릴 듯 말듯 희미하게 말했다. 눈을 감고 무엇인가를 거머쥐며 야릇한 웃음을 짓는다. 그것은 예견된 승리. 잠자는 노예다.
"우린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게 될거야."
"흐음… 그건 정말 안됐군."
가끔 삶을 살아가다보면 이런 일이 실재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니, 제법 많다. 그것들에 일일히 반응하는 건 피곤하다.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것이 상책이다.
"죽이는 건 그렇다 쳐도, 돈은 제대로 줘야지. 파격적인 것들 같으니."
우리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변소에서 일을 보고, 침실에서 잠을 잔다. 변소에서 스테이크를 써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거나, 혹은 혁신적인 행위일 것이다.
"거 참 신기한 우연이네. 나는 그 동명이인이랑 같이 살고 있다만."
정확히는 그게 '본명'은 아니었지만.
"그 자는 돈 깨나 만졌겠고… 하아."
어쩐지 아쉽다는 듯한 한숨이다.
30 페로사주 (ln9e3rUnuM)
2022-01-25 (FIRE!) 20:53:28
집안일은 느긋하게 다녀와- 나도 좀 씻고 와야겠다.
>>26 .oO(젠장)